얇은 철학책 한권을 '이주의 발견'으로 고른다(때론 얇은 게 미덕이다). 파스칼 샤보의 <논 피니토: 미완의 철학>(함께읽는책,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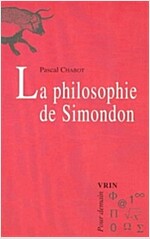

저자의 이름은 생소한데(그래서 '발견'이지만) 질베르 시몽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를 단행본으로 펴낸 바 있다. <시몽동의 철학>(2003). 이게 영어판(2013)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주목 받는 젊은 철학자인 듯하다. <논 피니토>의 원제는 <철학의 일곱 단계>.

저자와 책소개는 이렇게 떠 있다. "동시대 철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철학자 파스칼 샤보의 책. 철학자들이 좀처럼 던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철학 속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철학자들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파스칼 샤보는 신중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이 반성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다. 저자는 난해하고 불투명한 것에 자족하는 철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한다."
동시대 철학자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흥미를 갖게 하는 건 이 짧은 책에서 그가 던지는 질문이다. '당신은 철학에서 무엇을 찾는가'. "오로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철학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밝히려 할 때가 그렇다."(13쪽) 그리고 이 질문은 언제고 던져질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질문이 충분히 흥미롭다면, 독서는 이미 절반은 보상받은 것과 같다. 나머지 절반은 책에서 이런 대목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철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학자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학자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명제를 고안한 테오필 고티에를 따라 철학을 위한 철학을 주창한다면 용기 있는 소견일 수는 있을지언정 철학이 나아갈 방향 혹은 옹호해야 할 입장을 제시해주지는 못 할 것이다. 삶,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의무와 부당함을 망각한 사상가만이 그런 명제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 철학은 삶과 사유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코사 멘탈레(cosa menatle), 즉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일 뿐이다.
얇고 가벼운 책이라 며칠 가방에 넣고 다니며 읽어보려고 한다. 참, 시몽동의 책도 번역돼 있다.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그린비, 2011). 이건 좀 묵직한 책인데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이라고 한다(파스칼 샤보의 책 말고도 시몽동에 대한 연구서들이 영어권에서 나오고 있다).
시몽동은 자신의 박사학위 부논문인 이 책에서 기술적 대상들의 발생과 진화의 과정, 기술적 대상과 인간의 관계 맺음, ‘기술성’ 자체의 본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몽동은 기술적 대상들을 단지 이용가치만을 갖는 ‘물질의 조립물’로 보는 관점, 반대로 기술적 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는 테크노크라시적 관점, 그리고 (영화나 SF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인간을 적대하는 위협적인 ‘자동로봇’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모두 비판하면서 인간과 기술적 대상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기술철학'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철학자는 <에코그라피>(민음사, 2002)의 공저자 베르나르 스티글러다. <기술과 시간> 시리즈 말고도 다수의 저작을 활발하게 펴내고 있다. 영어판으로 올해 나오는 것으로 예고된 두 권의 타이틀 역시 흥미를 끈다...
14. 0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