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외에는 급한 원고가 없기에 며칠 벼르던 페이퍼를 적는다. 일종의 독서계획이다. 강의와 원고를 위해 읽어야 할 작품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마저 포기할 만큼 합리적인 성격은 아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세 명의 작가의 대작 세 편을 읽으려고 한다.



먼저 연말 화제작으로 떠오른 로베르토 볼라뇨의 <2666>(열린책들, 2013). 영어판으로는 한권이지만(한국어판보다도 영어판을 먼저 구했다), 작가는 5부로 이루어진 이 작품의 다섯 권의 책으로 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고 한국어판은 이에 따라 5권으로 분권돼 나왔다(맨오른쪽 표지는 갈리마르에서 나온 프랑스어판). 1750쪽이 넘는 대작. 규모만으로도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볼라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신을 다해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끌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 외적 요인보다도 독자들이 <2666>에 관심을 집중한 까닭은 생전에 볼라뇨가 이 작품에서 세계 최악의 범죄 도시인 후아레스의 여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루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80년이란 시간과 두 개의 대륙을 넘나들며 수수께끼의 연쇄살인마와 유령 작가를 두 중심축으로 내세워 전쟁, 독재, 대학살로 점철된 20세기 유럽 역사에서 인간의 악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되어 왔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보리스 안스키의 일기에서 서술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범죄와 제2차 세계 대전의 홀로코스트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멕시코 국경으로 상징적으로 수렴되며, 1백 명이 넘는 여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재생산된다.



볼라뇨의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지만 <2666>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구입했다. 흥미를 갖는 건 나치, 2차대전, 홀로코스트 등의 주제를 볼라뇨가 다루는 방식이다. 라틴 아메리카 작가에게 보통 기대하기 어려운 소재 아닌가.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대표작 <칠레의 밤>(열린책들, 2010)과 함께 <제3제국>(열린책들, 2013),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을유문화사, 2009) 등을 독서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야 번역된 걸 알게 된 조나탕 리텔의 <착한 여신들>(랜덤하우스, 2009). 국내 독자들에겐 외면 받았지만 이 미국 출생 작가의 900쪽이 넘는 데뷔 장편소설이 프랑스에서 출간되자 독서계가 들썩였다는 화제작이다. "이 소설은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과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수상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1백만 부가 넘게 팔리며 유럽을 뜨겁게 달군 밀리언셀러로 기록됐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상을 석권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문학상이 문학과 무슨 상관이냐!'며 수상을 거부한 걸로 유명하다. 현재는 바르셀로나에서 집필중이라는 그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갈 수밖에 없다(올해 중편집을 펴냈다). <착한 여신들>은 어떤 소설인가(영어본 제목은 <친절한 사람들>).
작가 조나탕 리텔은 어느 나치 친위대 장교의 목소리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독일 사람들을 치밀하게 파헤쳤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크라이나와 스탈린그라드, 아우슈비츠, 베를린 공습 그리고 히틀러의 비밀 벙커를 묘사하며 살상(殺傷)의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준 아픔과 고통, 광기의 역사를 회고한다.(...) 좋은 가장이자 친절한 이웃이었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들춰낸 작품이다. 누구도 미치지 않았으나 모두가 광기에 휩싸였던 지옥의 나날들에 대한 나치 친위대 장교의 묵시록적 고백을 담았다. 가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최초의 홀로코스트 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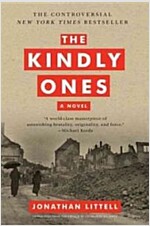


홀로코스트 문학이란 점이 특별히 프랑스에서 화제를 모은 배경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화제성을 설명할 수 없다. 작품이 궁금한 이유이기도 한데, 독서욕이 자극되어 영어본도 주문해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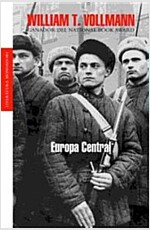

끝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작가 윌리엄 볼먼. 지난 2005년에 <중유럽>이란 소설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작가다. 2차대전 당시 독일의 옛소련 침공을 소재로 한 811쪽짜리 장편소설로 "대형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볼먼은 이 작품에서 초현실주의적이고 신화적인 가상의 인물들과 역사적 실재 인물들을 함께 등장시키고있다." 당시에 관련 기사를 읽고 작품을 바로 구입했는데, 이제까지 한국어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리텔이나 볼먼이나 '역사소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싶어서(혹은 새로운 유형의 역사소설)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작품이 길기만 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보르헤스는 장편을 쓰레기통에 비유했던가) 길게 쓰고도 독자를 감동으로 넉다운 시킬 수 있다면 그건 작가의 역량이다. 20세기 중반, 특히 나치 독일(제3제국)과 스탈린 시대 러시아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터라 세 작가의 대작 세 편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새해가 다가온다는 건 새로운 책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는 의미다. 새해가 기다려진다...
13. 12. 28.



P.S. 독일의 제3제국, 곧 히틀러의 독일에 대해서는 히틀러 관련서들 외에도 몇 권의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있다. 크리스 비숍과 데이비드 조든의 <제3제국>(플래닛미디어, 2012)는 그 성장과 몰락에 대한 개관이며, 안진태 교수의 <독일 제3제국의 비극>(까치, 2010)은 이 주제를 다룬 보기 드문 국내서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기억>(마티, 2007)은 "히틀러의 건축가이자 독일군의 전쟁 물자를 총괄한 군수장관으로,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에서 살아남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알베르트 슈페어의 자서전"이다. "지식인으로서 비판적으로 사유할 책무를 잊었던 치명적인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드러낸다." 내부자 시점의 기록이란 점에서 조나탕 리텔의 <착한 여신들>과도 비교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