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온다. 반가운 책도 있고 곤란한 책도 있다. 관심권에서 제쳐놓을 수 있는 책이라면 물론 곤란하지 않다. 곤란한 책이란 읽어보면 좋겠지만 읽기엔 여건상 부담스러운 책을 말한다. 두껍고 비싼 고전들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애써 구입하더라도 꽂아놓을 곳이 없는 요즘은 특히 그런 곤란함을 자주 느낀다. 지난주에 나온 가장 곤란한 책을 꼽자면 단연 요한 야콥 바흐오펜의 <모권1,2>(나남, 2013)다. 부제는 '고대 여성지배의 종교적 및 법적 성격 연구'다. '모권'과 '모권제 사회'란 개념의 원조가 되는 책. 물론 처음 소개된다.



바흐오펜(1815-1887)에 대해서도 백과사전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맑스사전>(도서출판b, 2011)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다(네이버에서 제공된다).
그리스 신화 속의 선사인류의 모권적 사회조직을 통찰하고 고대 로마법에서 부계출생에 선행하는 모계출생을 발견한 신화학자이자 로마법학자. 출생지인 바젤에서 공소심 판사(1845-66년)의 자리에 있으면서 고대사 연구에 몰두한 바흐오펜은 1861년에 주저 <모권론>(Das Mutterrecht)을 간행하고, 그 속에서 가장 오랜 인류의 혼인형태를 헤테리스무스(Hetärismus)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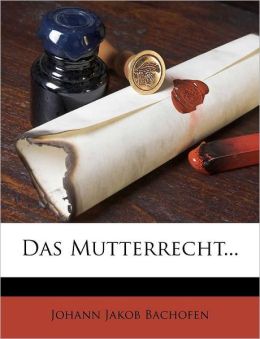
19세기 당시에 그 용어는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한 혼인 외의 성교를 의미했지만, 그가 신화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도도 성립해 있지 않은 시원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중에 미국의 고전 민족학자 모건을 따라 프로미스퀴테트(Promiskuität, 난혼)라고 바꿔 부른다. 그 시원적 형태는 모계 출생을 특징으로 하고 거기서 이윽고 동일 부족 내에서의 다른 씨족 간의 집단혼이 성립했다고 한다. 이것이 모권제 사회이다.
바흐오펜에 대한 모건의 영향은 커다란데, 1880년과 85년에 간행한 <고대서간>(Die Antiquarische Briefe, 전 2권)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맑스는 만년인 1880-81년경에 모건의 <고대사회> 및 러보크의 <문명의 기원>(1870)을 읽고서 <모권론>을 알게 되어 각각의 독서 노트에 그에 관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자료로 한 고대 연구의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1883년 3월 맑스의 죽음은 그로부터 그것을 실행할 시간을 영구히 앗아갔다.
엊저녁 영화를 보러 갔다가 대기 시간에 들른 서점에서 <모권>의 실물을 볼 수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1권이 빠진 2권만 서가에 꽂혀 있었다. 누군가 구입해 간 것이다. 작은 서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책의 독자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다(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선뜻 사 가지고 갈 때 느끼는 당혹감이다). 구입해봐야 당장은 장서용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입맛을 다실 수밖에.



구입을 미룬다면 핑계가 없진 않다. 작년에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두레, 2012) 출간을 계기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고대사회 연구를 촉발한 또 다른 책으로 루이스 헨리 모건의 <고대사회>(문화문고, 2005)가 절판된 이후 아직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모권>과 함께 나란히 꽂혀 있어야 할 책이다. 게다가 대타로 읽어볼 만한 책도 있다. 에리히 프롬의 <여성과 남성은 왜 서로 투쟁하는가>(부북스, 2009)이다. '사랑, 성애, 모권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다룬 책인데, 가장 먼저 해명하는 것이 바흐오펜의 모권 발견과 그 사회적 의미다. '맛보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이 책 또한 소장도서이지만 현재로선 찾을 수가 없다)...
1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