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실린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의 <플루토크라트>(열린책들, 2013)를 다룬 것인데, '슈퍼 리치', 신흥 갑부들을 다룬 책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현단계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책이다. 자본주의 이행기의 러시아를 다룬 저자의 전작, <세기의 세일: 러시아의 두번째 혁명 이야기>도 바로 주문했는데, 이 또한 소개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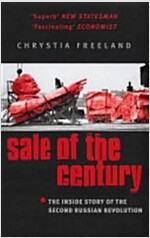
중앙일보(13. 10. 12) 1대 99의 시대 ? 아니 0.1대 99.9의 시대
플루토크라트? 일단 제목부터 확인하자. 그리스어로 부(富)를 뜻하는 ‘플루토’와 권력을 의미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로 ‘부와 권력을 다 가진 부유층’을 가리킨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승자로 부상한 0.1%의 신흥 갑부들이다.
이른바 ‘글로벌 수퍼리치’는 어떤 이들이고, 또 그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움직이는가. 언론인이자 산업 전문가인 저자는 플루토크라트의 세계를 놀랄 만큼 생생하고 정밀하게 보여준다. 곧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이다”라는 주장에 충실하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데이터를 보자. 2005년을 기준으로 빌 게이츠의 재산은 465억 달러이고, 워런 버핏은 440억 달러다. 두 사람의 재산 합계는 미국 전체 인구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명의 재산 총계 9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예외적인 억만장자들이라고만 치부할 순 없다. 그들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수퍼엘리트 계급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플루토크라트와 그 나머지’로 양분됐다.
새로운 플루토크라트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부자 감세다. 레이건 행정부는 최상위 한계세율을 70%에서 28%로 삭감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더 가속화했다. 기술혁명과 세계화,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의 등장이 세계경제를 변화시켰다.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본격 편입되면서 이들 신흥 국가들이 첫 번째 도금시대(鍍金時代)를 겪는 동안 서구사회는 두 번째 도금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 쌍둥이 도금시대의 수혜를 최상층이 독점한 결과가 플루토크라트의 시대를 만들었다. 미국의 중산층이 차이나 신드롬에 밀려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동안에도 수퍼엘리트들은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며 부를 축적했다.
과거 부자들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기에 부자였다면 오늘날 플루토크라트들은 ‘일하는 부자’다. 그들은 부를 소비하는 것뿐 아니라 창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수퍼엘리트가 되기 위한 중요한 자질이 시차 적응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전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우리는 아내보다 비행기 승무원들을 더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라고 말하는 부류다.
또한 자본주의를 일종의 해방신학으로 받아들여서 자유로운 시장이 곧 자유로운 인간의 조건이라고 믿는다.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시민이고자 한다.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플루토크라트는 공익활동에도 열성적이어서 ‘박애 자본주의’의 실천자이기도 하다. 자본가는 선행을 실천해야 하고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진정한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은 이들의 생각을 대변한다.
사실 빈부격차라면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현재의 격차는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롭다. 또 사정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1940~70년대 사이에는 부유층과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이 1940년에 16%였던 것이 70년에는 7% 아래로 떨어졌다. 빅3 자동차 기업과 노조와의 대타협으로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된 반면 최상층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1980년 미국 CEO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소득의 42배였지만 2012년에는 380배로 치솟았다.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낙수효과)은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은 2010년에도 세계경제는 전체적으로 6%나 성장했지만, 이 기간 소득 증가분의 93%는 상위 1%가 차지했다. 파이는 커지더라도 많은 사람의 몫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말 그대로 승자독식사회다.
흥미로운 것은 그 상위 1%도 분화돼 있다는 점. 부의 독점과 빈부격차의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월가 점령시위의 이슈이기도 했던 ‘1 대 99 사회’이지만, 저자는 그 1% 내에서도 0.1%의 갑부들과 그 아래 0.9%의 부자들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한다. 83년과 2000년 사이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부자 목록에서도 상위 25%는 4.3배 더 부유해진 반면에 하위 75%는 2.1배 부유해지는 데 그쳤다. 5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는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8만4700명이 있는데, 그 중 2700명은 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최상층과 중상층의 분리와 격차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백만장자들이 스스로 억만장자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어야, 슈퍼엘리트들이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무너진다면? 계급전쟁은 1% 대 99% 사이에서가 아니라 0.1%(억만장자) 대 0.9%(백만장자)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전망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이 계급전쟁의 구경꾼에 불과한 것인가.
플루토크라트를 대놓고 비판하진 않지만, 부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를 낳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는다는 저자의 지적은 온당하다. 사회적 분열과 적대 속에서도 과연 플루토크라트는 그들의 부와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현단계 자본주의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 ‘나머지’들이 탐독할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13.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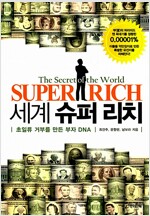


P.S. <플루토크라트>의 번역은 막힘이 없지만, 적어도 한 곳은 오역 같다.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젊은이를 뜻하는 'young fogey'라는 표현도 <스펙테이터>가 1984년에 만들어낸 신조어다."(99쪽)에서 '1984년에 만들어낸 신조어'는 '<1984>식의 신어'가 아닐까. 소설 <1984>에 나오는 '뉴스피크(New Speak)' 말이다. 한편, 슈퍼리치를 다룬 책들은 이미 여럿 소개돼 있다. <플루토크라트>에다 더 얹어서 읽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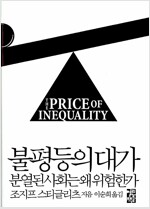
동시에 유례 없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책들도 필독해볼 만하다.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21세기북스, 2012), 원제가 '승자독식의 정치학'인 제이콥 해커와 폴 피어슨의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21세기북스, 2012),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열린채들, 20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