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쓰는 일이 드문 편이어서 파스를 붙일 일이 거의 없지만, 어쩌다 목을 잘못 뉘고 자는 바람에 어제오늘 목에다 파스를 뭍이는 신세다. 어디가 아프거나 고장나야 존재를 인지하는 게 생리인지라 어제오늘은 '목'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실히 알겠다. 고개를 뻣뻣히 세우고 있자니 무슨 로봇 같기도 하다. 아직 개발이 덜 돼 뒤로 젖히는 기능은 빠져 있는 로봇. 그런 자세로 오늘 배송받은 책 하나를 책상맡에 놓고 페이퍼를 적는다. <영화이론이란 무엇인가>(명인문화사, 2013)란 책이다.



영화학 관련서를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형식 교수의 번역인데, 따져보니 저서인 <무대와 스크린의 만남>(명인문화사, 2013)을 제외하고는(보관함에 넣었다) 꽤 많은 책을 구입했다.



<영화에 대해 생각하기>(명인문화사, 2009)를 비롯해서, 벨라 발라즈(발라슈)의 <영화의 이론>(동문선, 2003), 로버트 리처드슨의 <영화와 문학>(동문선, 2000), 몰리 해스캘의 <숭배에서 강간까지>( 나남, 2008)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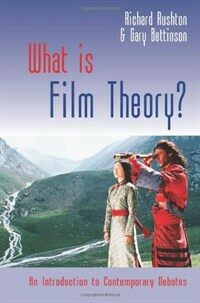
이번에 나온 건 리처드 러쉬톤과 게리 베팅슨 공저인데, 원자가 200쪽 남짓의 얇은, 그러니까 적당한 분량이라는 게 강점이다. 게다가 현대 영화이론의 다양한 갈래와 전개를 가장 최근의 이론까지 압축적으로 정리해놓고 있다(원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놓았다). 구조주의와 기호학에서 시작하여 들뢰즈와 함께 스탠리 카벨을 다루고 신형식주의와 인지주의까지 망라하는 영화이론서는 드물지 않나 싶다.



지난해에도 로버트 스탬의 <영화이론>(경문사, 2012), 토마스 앨새서와 말테 하게너의 <영화이론>(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그리고 프란체스코 카세티의 <현대 영화이론>(한국문화사, 2012) 등이 소개됐지만 그 압축성에 있어서는 <영화이론이란 무엇인가>가 단연 돋보인다(영화이론 강의를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아무튼 적당한 분량의 미덕을 환기시켜주는 책이 나왔기에 반가움을 간단히 적었다. 영화이론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종류의 책이 더 나왔으면 싶다...
13. 0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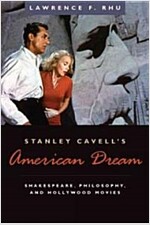
P.S. 스탠리 카벨은 하버드대학의 미학 교수인데, 영화와 문학비평 쪽에도 상당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찾아보니 그의 영화론에 관한 연구서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