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덥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꽤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신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벽마다 책장이다) 에어컨을 달지 않은 탓에 선풍기 바람으로 꿋꿋하게 버텨야 하는데, 아무래도 독서의 효율은 떨어진다. 독서실을 끊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돼 잠시 아이스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가다듬다가 '이주의 발견'을 적는다. 몇권의 후보가 있었는데, 더 뒤적거릴 여유도 없어서 눈에 띄는 책을 책상맡에 갖다놓았다. 도널드 프레지오시 편저의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미진사, 2013). '21세기를 위한 미술사 입문서'라는 건 이 책에 대한 로버트 로젠블럼(뉴욕대 교수)의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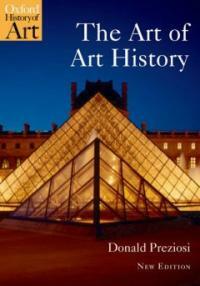
제목 그대로 예술이론과 비평 40편을 모아놓은 것으로 미술비평이나 미술사 전공자들의 교재용 책이다. 관련 전공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읽어나가는 용도이고, 원저는 옥스포드대학출판부에서 나왔다. 편저자도 나름 명망가이고(그래서 원서를 주문하면서 그의 책도 하나 더 주문했다), 번역은 홍대 미술대학 예술과 교수와 제자들이 맡았다.
개인적으로는 '꼭 읽어야 할', 이런 말이 들어간 제목을 싫어하기에, 번역본의 제목은 좀 유감스럽긴 하다. 원저의 제목처럼 <미술사의 기술> 정도로 가거나 <예술이론과 비평 40선> 정도가 좋았겠다. 이 책의 독자가 초등학생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명에 대해서 역자는 E. Gombrich의 국내 통용 표기인 '곰브리치' 대신에 '곰브릭'이라고 옮겼다. 국내에서는 '곰브리히'로 관례적으로 사용하지만 해외에서 '곰브릭'으로 불린다는 게 이유다(그런 식이면 '언스트 곰브릭'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또 '에른스트 곰브릭'이다. '곰브리히'는 출처가 또 어디인지?). 그런 이유라면 '플라톤'도 '플레이토'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밖에 나가 보니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밖에 안 된다. 굳어진 고유명사는 '한국어'란 인식이 필요하다(선집까지 나오고 있어도 '벤야민'을 '베냐민'으로 표기하는 방식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곰브리치가 재직했던 런던의 '바르부르크연구소'도 독일 태생의 바르부르크(A. Warburg)를 영국에선 '워버그'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워버그연구소'가 됐다. 내가 유감을 가질 건 아니고, 명칭 문제는 전공자들이 알아서 합의를 보면 좋겠다.



디테일한 면에서는 불만스럽지만, 여하튼 이런 앤솔로지를 나는 좋아하는 편이다. 아직도 '대학원' 감각을 갖고 있어서인가 보다. 제이 에멀링의 <20세기 현대예술이론>(미진사, 2013)과 <새로운 미술사를 위한 비평용어 31>(아트북스, 2006)도 원서와 함께 구비해놓았었다. 거기에 조나단 해리스의 <신미술사? 비판적 미술사!>(경성대출판부, 2004)까지. 나름대로 대학원 수준의 이론공부를 할 준비는 다 돼 있다. 그게 가능한 건 이론이 통분야적이기 때문이다. 곧 문학이론이나 영화이론, 미술이론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일례로 푸코의 '작가란 무엇인가'나 벤야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은 <꼭 읽어야 할 예술이론과 비평 40선>에도 수록돼 있다.
책 이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그러니까 당분간은) 체계적인 독서가 어렵겠지만, 언젠가 좀 여유를 갖고서 '40선'에 대한 독서를 해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위를 먹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13.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