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저자'를 간단히 골라놓는다. 이번주엔 흥미를 끄는 책이 많아서 이주의 저자도 후보들 가운데 추려야 했다. 먼저 인류학자 웨이드 데이비스의 <나는 좀비를 만났다>(메디치, 2013). 원제는 <뱀과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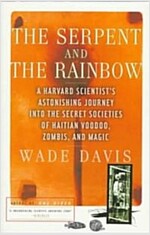

소개에 따르면, "인류 최고의 미스터리 ‘좀비’를 파헤친 책으로 저자의 독특한 프로필처럼, 인류학과 과학, 역사학뿐 아니라 탁월한 비유가 섞인 인문학 탐사 다큐멘터리다. 11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고, 출간 이래 아마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 왔다. 공포영화의 거장 웨스 크레이븐이 <악령의 관>으로 영화화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웨이드 데이비스는 TED 강연에서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유명 민속식물학자다."

'민속식물학자'란 직함이 특이한데, 실제로 저자의 전공분야가 그렇다. 저자 소개에 따르면 그는 "원시문화를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인류의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원시부족들은 여전히 동물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식물로 치료"하기 때문이다. 좀비 문제를 다루게 된 것도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겠다.
아무튼 제목대로 '좀비'에 관한 흥미로운 인류학적 탐사 보고서로 읽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좀비가 아이티의 식민주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이 간다. 배경 설명은 이렇다.
1982년 초, 웨이드 데이비스는 죽었던 사람이 좀비로 되살아났다는 뉴스를 파헤치기 위해 좀비의 고향 ‘아이티’로 급파된다. 하버드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던 저자는 좀비 독약에 주목하고 위험천만한 과정을 겪으며 독약 제조법을 입수한다. 그러나 좀비와 관련된 진실은 간단치 않았다. 좀비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웃에 해를 끼치는 인물을 처단하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형벌이었고, 재판의 집행자는 아이티 정부 조직과 별개로 공공연히 활동하는 비밀조직이었다. 비장고 등 비밀조직은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당한 아이티 흑인들이 저항했던 역사 속에서 파생된 것이다.



해서 '좀비' 계열의 책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아이티의 식민주의 역사와 해방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읽을 수도 있을 듯싶다. <헤겔, 아이티, 보편사>(문학동네, 2012), <블랙 자코뱅>(필맥, 2007). <식민주의 흑서>(소나무, 2008) 등을 같이 떠올리게 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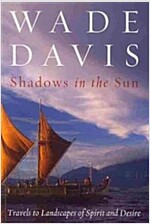
한편 저자 웨이드 데이비스의 책으론 <세상 끝 천 개의 얼굴>(다빈치, 2011)과 <시간 밖의 문명>(무우수, 2006)이 더 소개됐었다(<시간 밖의 문명>은 절판된 듯하다. 원제는 <태양 아래 그림자들>). <세상 끝 천 개의 얼굴>은 책을 구하고도 무심히 넘어갔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다시 찾아봐야겠다. 소위 '인종권'을 다룬 책이다.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민속식물학자인 웨이드 데이비스의 책. 그가 40여 년의 세월 동안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세상의 오지들을 탐험하며 생태의 신비와 문화의 다양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다양한 저술의 결정을 심도 있는 에세이로 풀어낸 독보적인 기록이다. 아마존의 열대림과 안데스의 산악지대부터 아이티의 보둔교, 말레이시아의 원시림, 북아프리카의 사막과 눈 덮인 티베트, 그리고 북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능숙한 필치와 시선을 압도하는 사진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한 경이로움과 비극이 펼쳐지는 세상 끝에서 ‘인종권(ethnosphere)’을 만난다.



두번째 저자는 정유정이다. 이미 <28>(은행나무, 2013)이 독자와 만나고 있는데, '좀비'라는 말 때문에 떠올리게 됐다. 소위 '문단문학' 바깥의 가장 '핫'한 작가의 이번 소설은 "'불볕'이라는 뜻의 도시 '화양'에서 28일간 펼쳐지는, 인간과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생존을 향한 갈망과 뜨거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아직 보진 않았지만 대니 보일의 좀비 영화 <28일 후>를 떠올려준다. 왜 하필 28일일까? 혹은 전염병이란 소재에 한정하면 카뮈의 장편 <페스트>도 연상해볼 수 있다. 한국문학에서는 흔치 않은 소재인지라 이 뚝심 있는 작가가 어떻게 써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세번째 저자는 장편 <로베스피에르의 죽음>(문학과지성사, 2013)의 저자 서준환. 2001년에 등단해 <너는 달의 기억>, <고독 역시 착각일 것이다> 등의 소설집을 펴냈고 장편소설은 <골드베르크 변주곡>에 이어서 두번째로 보인다. 제목이 특이한데, 더 특이한 건 '로베스피에르'가 그 프랑스혁명의 주역 로베스피에르라는 점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전기와 프랑스혁명사를 재료로 삼아 쓴 소설(나는 이런 소설이 '한국소설'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한국어 소설'과 '한국소설'이 다르다면 말이다). '한국소설'이 아닌 그냥 '소설'로 읽으면 될 터인데, 구성은 또 서막과 에필로그가 포함된 3막 드라마이다.



여러 모로 독일의 천재 극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의 죽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데, 발문을 쓴 장정일 작가도 자연스레 두 작품과 두 인물,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을 비교하고 있다(이번 가을에 예술의 전당에서 <당통의 죽음>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제대로 음미하자면 이것저것 공부할 게 많은 소설이다. <당통의 죽음>을 읽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프랑스혁명사를 바탕으로 로베스피에르의 전기와 그의 사상까지도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에 관한 책은 드물지 않은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주명철 교수의 <오늘 만나는 프랑스혁명>(소나무, 2013)이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전기는 장 마생의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교양인, 2005), 그의 혁명관에 대해서는 지젝이 서문을 쓴 <로베스피에르: 덕치와 공포정치>(프레시안북, 2009)를 참고할 수 있다. <덕치와 공포정치>는 현재 절판된 상태인데, 지젝의 서문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그린비, 2009)에서도 읽을 수 있다. 고른 건 세 명인데, 읽을 책은 왜 이리 많은 것인가...
13.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