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눈에 띄는 신간 가운데 하나는 알랭 바디우와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의 대담집 <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문학동네, 2013)이다. 저명한 철학자와 정신분석사가가 라캉의 사상을 논한 책인데, 일단은 저자들의 이름값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게다가 책이 아주 얇은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책갈피에 실린 루디네스코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녀는 "라캉 사후 프랑스의 정신분석 역사를 집대성한 <프랑스 정신분석사>(1권 1982, 2권 1986)를 썼고, 라캉 전기 <자크 라캉>(1993)에서는 라캉을 중심으로 20세기 중반 프랑스 지성계의 풍경과 정신분석계의 분열상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국내에는 그 <자크 라캉>(새물결)이 두 권짜리로 번역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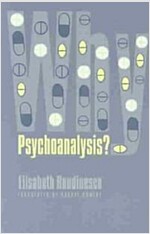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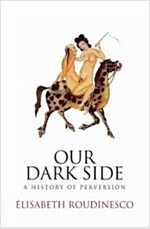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밖에 <왜 정신분석인가?>(1999), 미셸 플롱과 공저한 <정신분석 사전>(1997), 광기에 빠져 정신병동에서 생을 마친 여성 혁명가를 다룬 전기 <테루아뉴 드 메리쿠르: 프랑스혁명기의 한 멜랑콜리한 여성>(1989),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성도착의 역사>(2007) 등을 펴냈다."
소개에서 <왜 정신분석인가?>는 얇은 책인데 아직 번역되지 않았고, <정신분석 사전>은 <정신분석대사전>(백의, 2005)라고 번역됐지만 절판됐다. <테루아뉴 드 메리쿠르>도 아직 번역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은 <악의 쾌락, 변태에 대하여>(에코의서재, 2008)로 번역됐지만 번역에 흠이 많다.



바디우의 책이야 다수 소개돼 있는 만큼(주저들은 빠져 있다) 더 언급하는 건 군더더기일 테다. 다만 그의 <사도 바울>(새물결, 2008)의 역자가 <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의 역자이기도 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역서 가운데 근간으로는 바타유의 <주권>과 장 미셸 팔미에의 <발터 벤야민: 넝마주의, 천사, 꼽추난장이>가 있다 한다(<주권>은 <저주의 몫>의 일부인 듯하다). 아무려나 기대를 갖게 하는 책들이다.
다시 <라캉, 끝나지 않은 혁명>으로 돌아와서, 바디우와 루디네스크가 말하는 라캉의 현재적 의의는 무엇인가. 한 대목씩만 인용해놓는다.

“저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라캉에게서 보고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일탈에 사로잡힌, 민중도 주체도 없이 비인간화된, 금융 자본주의 말이에요. 이 광기에 대항해 라캉에게서 영감을 얻는 것은 질서 안에 무질서를 심는 일일 수도 있죠. 역사의 전환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범적 텍스트인 <사드와 함께 칸트>(1963) 읽기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문제틀의 상이한 두 측면이 관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정언명령을 주이상스의 명령에 결부시키는 일, 이것은 현대사회의 상이한 두 측면인 과학주의와 몽매주의에 맞서 똑똑하게 분노할 수 있게 해줍니다.”(루디네스코)
“현대 세계는 불확실성과 방향 상실, 항구적 위기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라캉은 위대한 혼돈의 사상가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정신분석을 주체의 혼돈에 대한 정돈된 사유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정신분석은 마르크스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마르크스주의 또한 자본주의의 모든 혼돈을 구성하는, 격렬한 혼란과 만족시킬 수 없는 탐욕스러운 모순들 위에 근거한 집단적 실존을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성찰하려면 라캉은 필수불가결한데, 왜냐하면 그가 이 혼돈 자체에서 어떤 내재적 질서를, 상징계의 지평과 연계된 참조틀을 재포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바디우)
13. 0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