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저자'를 골라보았다. 국내 저자, 더 정확하게는 국내 시인 세 사람이다. 산문집과 시집을 펴낸 마종기, 김정환, 황병승 시인이 그들이다.



먼저 마종기 시인의 <우리 얼마나 함께>(달, 2013). 시인이자 의사로 평생을 살아온 특이한 경력의 시인의 의사생활에서 은퇴한 후 "십 년간 고국의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과 새롭게 적은 몇 편의 글을 엮어" 펴낸 산문집이다. 시집이 아닌 책으로는 에세이집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비채, 2010)와 루시드 폴과의 서신교환집 <아주 사적인, 긴 만남>(웅진지식하우스, 2009)에 이어지는 책.



이미 <마종기 시 전집>(문학과지성사, 1999)까지 나왔었지만 이후에도 시작은 멈추지 않아서 <전집> 이후에도 세 권의 시집을 연이어 펴냈다. '전집'이란 말이 머쓱해지는데(한국 문학계에서는 '전집'이란 말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회갑 기념 시집 정도의 의미였다고 해야겠다. <마종기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1999)가 <전집>과 짝을 이루는 책. 1960년에 나온 첫 시집 <조용한 개선>(문학동네, 1996)도 다시 나와 있다. 이번 산문집의 한 대목.
일흔이 넘은 내 나이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인데 그전에 몇 개 안 되는 아버지의 작품과 유물을 어떻게든 고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 결심은 물론 내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유물을 보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다. 미국에서 난 세 아들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로 좋은 교육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아직 할아버지의 동화 한 편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다. 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친할아버지라고 해도 유물을 대물려 간직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작품과 유물' 얘기가 나온 건 시인이 동화작가 마해송 선생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같은 작품은 나도 초등학생 때 읽은 기억이 난다. 부전자전 문학인으로는 마종기 시인과 비슷한 연배이자 친우 황동규 시인을 떠올리게 한다(황동규 시인은 작가 황순원 선생의 장남이다). <아버지 마해송>(정우사, 2005)이란 책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품절이라 아쉽다.



장르 불문의 전방위 작가, 번역가로 활동중인 김정환 시인의 신작 시집 <거푸집 연주>(창비, 2013). 아주 오랜만에 창비시선으로 나온 시집인데, 시인의 한 마디도 "<순금의 기억> 이후 17년 만인가. 창비, 안녕? 대체로, promenade, 발표순을 따랐다."이다. <순금의 기억>(창비,1996)을 염두에 둔 것인데, 그렇게 적조했다 하더라도 김정환은 '창비 시인'이다.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데뷔했을 뿐더러 첫 시집 <지울 수 없는 노래>(창비, 1982)도 창비에서 출간됐기 때문이다. 대학 신입생 시절 이성복, 황지우 시집과 같이 읽던 김정환의 시집들도 기억이 난다. 아래는 이번 시집의 서시.

이제는 너를 향한 절규 아니라
이제는 목전의 전율의
획일적 이빨 아니라
이제는 울부짖는 환호하는
발산 아니라 웃는 죽음의 입 아니라 해방 아니라
너는 네가 아니라
내 고막에 묻은 작년 매미 울음의
전면적, 거울 아니라
나의 몸 드러낼 뿐 아니라, 연주가 작곡뿐 아니라
음악의 몸일 때
피아노를 치지 않고 피아노가 치는 것보다 더 들어와 있는 내 귀로 들어오지 않고 내 귀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들어와 있는
너는 나의
연주다.
민주주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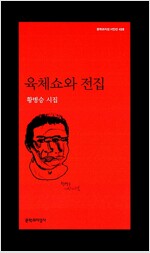


'완전소중' 황병승 시인도 오랜만에 세번째 시집을 펴냈다. <여장남자 시코쿠>(문예중앙, 2005; 문학과지성사, 2012), <트랙과 들판의 별>(문학과지성사, 2007)에 이어지는 <육체쇼와 전집>(문학과지성사, 2013).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찬반과 논란의 대상이 된(그는 '미래파 논쟁'의 중심이었다) 시인의 신작들이 기대된다. 시인의 말에는 이렇게 적었다.

어떤 밤에 우리는
연필의 검은 심을 모질게 깎고
이 고독한 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 고독한 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서로의 얼굴을 백지 위에 갉작 갉작 그려 넣으며
납득이 가지 않는 페이지는 찢었다
그렇다면 '납득이 가는 페이지'들로 채워진 시집이란 의미일까. 난해하다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그의 시들을 멀리 했던 독자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걸로도 읽을 수 있겠다.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는 노릇이고...
1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