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사IN(295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강명관의 <침묵의 공장>(천년의상상, 2013)을 읽고 적은 것이다. 문제제기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아쉬운 책이었다. 국문학 비판과 관련해서도 저자의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소명출판, 2007)에서 더 나아간 것 같지 않다. 좀더 묵직한 책이 나오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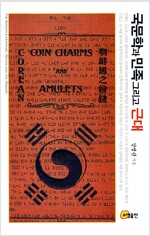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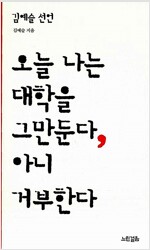
시사IN(13. 05. 11) 인문학의 대학 탈출법
한문학자 강명관의 <침묵의 공장>을 읽으며 먼저 떠올린 건 지난 2010년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써 붙이고 고려대를 자퇴한 김예슬이다. 자퇴의 변을 담은 <김예슬 선언>(느린걸음)에서 저자는 오늘날 대학이 ‘큰배움’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됐으며 더 이상 ‘배움도 물음도 없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에 대한 절망을 담은 이 당찬 ‘대학 포기 선언’에 공감과 냉소가 교차했지만 어느덧 ‘과거지사’가 됐다. 한국은 침묵에 익숙한 사회다.
강명관은 그런 침묵에 다시 묵직한 일성을 던진다. 그가 ‘침묵하는 공장’이란 말로 가리키는 건 ‘대학’이다. 대학은 소위 학문을 하는 곳이고 교육을 하는 곳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 대학은 “한 개인의 사회적 서열을 매기는 곳이고, 차등화된 노동자를 배출하는 곳이 된 지 오래”라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국가, 자본, 테크놀로지가 이루는 트라이앵글이고 대학과 인문학 역시 이 트라이앵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국가가 연구비를 무기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학의 인문학이 본연의 인문학일 수 있느냐고 그는 묻는다. 그것은 ‘관학(官學)’이 아니냐고 일갈한다.
목소리는 사뭇 높지만 생경한 비판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방도가 있느냐는 것이다. 문제 제기의 강도에 비하면 저자의 행동지침은 예상보다 과격하지 않다. 너무 점잖다 싶을 정도다. “가능한 한 학진(학술진흥재단)과 외부 기관을 우습게 알면서 그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 낮추고, 등재지를 경멸하면서 최소한의 논문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대학의 행정적 간섭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권력과 지배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탈출할 것!”이라는 게 그의 권유이기 때문이다. 과연 연구지원기관을 우습게 알고 국가관리 학술지를 경멸하는 것 정도로 자본과 국가, 테크놀로지로부터의 독립과 인문학 갱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냉소적인 거리를 독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혹 인문학자의 ‘정신승리법’에 불과한 게 아닐까.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의문을 갖다 보니 “인문학의 유일한 생존로는 인문학자가 다시 수공업의 장인이 되는 데 있다.”라는 저자의 선언적 주장도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국사학과 국문학의 지배적인 연구 경향에 대해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대목들이 눈에 띈다. 저자는 국문학 연구가 서구 근대문학이라는 틀로 한문학을 재단하고 배제한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한 배제의 결과 “양적으로 풍부한, 그리고 국문문학에 훨씬 고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문학”이 여전히 ‘방외(方外)’에 있고, “한문학의 풍요로운 성취”는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문학이란 무엇이던가. 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우리가 물려받은 문학 유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문학은 지배층인 남성-사대부의 것”이고, “곧 사대부 계급의 이익을 위한 문학”이다. 저자는 전근대 한문학에서는 문학과 생활의 교직이 특징적인 면모였으며 그렇게 창작과 감상, 작가와 독자가 일치했던 ‘행복한 시절’을 우리가 망실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때 서로 일치했던 작가와 독자는 대부분 남성-사대부였을 것이다. ‘풍요로운 성취’와 ‘행복한 시절’에 대한 회고적 감상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다.
1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