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전화에 잠이 깨고 세수도 하기 전에 택배를 받으며 하루가 시작됐다(9시도 되기 전에 다녀가다니!). 당일배송이 지켜진다면, 오후에도 두세 개의 택배가 더 와야 한다. 하긴 책은 매일 쏟아지고, 나도 거의 매일 주문을 하니까. 잔뜩 쌓인 책들과 장바구니에 들어 있는 책들 가운데 '이주의 책'을 고르려다가 초점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이주의 저자'를 먼저 고른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다.



먼저 영국의 비평가 레이먼드 윌리엄스(1921-1988). 주저 가운데 하나인 <시골과 도시>(나남, 2013)이 출간됐다. 소개를 옮기자면, "문화연구의 새 장을 연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대표작. 주로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진행된 도시화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왜 하필 잉글랜드일까? 그것은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흥했을 뿐 아니라 이후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역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해하고 그것의 여러 문제들을 성찰하는 데 요긴한 사례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번역된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을 제외하면 현재 윌리엄스의 대표작이라고 번역된 책은 <키워드>(민음사, 2010)와 <기나긴 혁명>(문학동네, 2007)까지 세 권이다. 발간순으로 하면 <기나긴 혁명>(1961)-<시골과 도시>(1973)-<키워드>(1976) 순이다(<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은 1977년에 나왔다). 윌리엄스의 출세작은 <문화와 사회, 1780-1950>(1958)인데, 절판됐지만 이대출판부(1988)에서 번역본이 나온 바 있다(저자가 '레이몬드 윌리암즈'로 표기돼 있다). <키워드>는 <문화와 사회>의 속편 격 책이다.



오래 전 기억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20세기 영국 비평사에서 F. R. 리비스와 테리 이글턴 사이에 놓인다. <시골과 도시>의 책소개를 보니 그런 맥락이 다시 환기된다. "<시골과 도시>가 출판될 당시 영국에서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재앙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도래 이전 시기를 신비화하고, 잉글랜드의 옛 시골 마을을 ‘유기적 공동체’로 이상화하는 풍조(F. R. 리비스로 대표되는)가 유행하였는데, 저자는 이러한 풍조를 통박한다." 모처럼 무게 있는 비평가의 묵직한 저작이 소개돼 반갑다(그러고 보니 역자인 이현석 교수는 테리 이글턴의 <우리시대의 비극론>(경성대출판부, 2006)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다).



지나가는 김에 검색해보니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길, 2012)까지 소개된 이글턴의 신작으론 <문학이라는 사건>,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연못을 넘어서: 한 영국인의 미국관> 등이 있다. 아무래도 저명한 문학비평가의 책이다 보니 이래저래 관심이 간다.



그리고 두번째 저자는 지그문트 바우만. 국내 인문 독자들에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동녘, 2012)을 통해 확실한 인지도를 갖게 됐지만 진작부터 소개된 사회학자다(심지어 '우리시대의 구루'라고 불리는). 이번에 나온 <리퀴드 러브>(새물결, 2013)는 바우만 사회학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리퀴드' 시리즈의 하나인데, 이 시리즈의 책으론 <액체 근대>(강, 2009), <유동하는 공포>(산책자, 2009)가 출간된 바 있다.



올해도 시리즈의 책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거의 바우만과 생사를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무엇이 '리퀴드 러브'인가?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가 20세기형 인간을 특징지었다면 이제 21세기는 ‘유대 없는 인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바우만의 진단과 통찰에 귀 기울여보면 좋겠다(오전에 한 일 중의 하나가 <리퀴드 러브>의 원서를 찾는 거였는데, 다행히 찾았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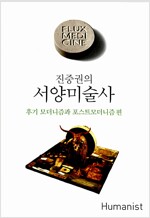


끝으로 국내 저자도 꼽도록 한다. 진중권의 '서양미술사'가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후기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편>(휴머니스트, 2013)을 끝으로 5년만에 완간됐다. <서양미술사: 고전예술 편>(2008),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2011)과 함께 삼부작이다. 계속 나오고 있는 유홍준의 <한국 미술사 강의>와 함께 미술사 독자들에겐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만하다(미학자 진중권의 다음 작업이 궁금해진다. 미학이론이 될까?) <서양미술사>를 마무리지으면서 저자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술사를 재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책은 독자들을 지붕에 올려놓는 사다리에 불과하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지붕에 올라갔거든 이 사다리를 치워버려라. 이 책을 읽은 후에 독자가 또 다른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만의 미술사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저자에게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서양미술사>를 애독해온 독자라면 한번 저자를 기쁘게 해보아도 좋겠다...
13.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