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 드 보통이 니얼 퍼거슨을 만난다는 착상은 나의 것이 아니다. 로먼 크르즈나릭의 <원더박스>(원더박스, 2013)를 두고 로버트 켈시란 이가 "알랭 드 보통이 니얼 퍼거슨을 만났다고 생각하라... 일상생활에 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과 사회사가 적절하게 만난 기막힌 책이다."라고 평했다(책 제목이 <원더박스>인데, 출판사도 원더박스인 걸 보면 아마도 이 책에 꽂혀서 책을 내기 시작한 곳인가 보다. 이제까지 세 권의 책을 냈고 폴 우드러프의 <아이아스 딜레마>는 관심도서다).



로버트 켈시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가?>란 책의 저자로 나오는데,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듯하니 별로 의미가 없다. 하지만 <원더박스>란 책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어서 나는 망설임 없이 책을 펼쳐들었다. 오호, 더 강력한 추천사가 버티고 있었다!
"지난 3,000년 역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 뿐이다." -괴테
물론 괴테가 이 책을 추천한다는 건 난센스이지만, 효과는 같다. 저자가 말하길 이 책은 괴테의 생각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곧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최근 3,000년을 살펴보면서 열두 가지 주제에 대한 성찰을 얻는다는 것이 그의 발상이다. 그걸 뭉뚱그리자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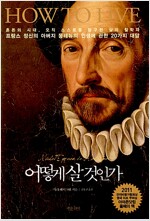


주제 면에서 보자면, 작년에 나온 사라 베이크웰의 <어떻게 살 것인가>(책읽는수요일, 2012)에 이어진다고 할까. 아,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아포리아, 2013)도 있다. 역사가 아닌 철학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제임스 밀러의 <성찰하는 삶>(현암사, 2012)도 같은 계열이다. 요컨대 이런 책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원더박스>의 독자이기도 하다는 것.

제목 '원더박스'는 무슨 뜻인가. 얼핏 진기한 물건들을 모아놓은 상자처럼 보이는데, 상자보다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 저자의 설명이다.
나는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 '호기심의 방'과 유사한 '원더박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인들은 이를 분더캄머(Wunderkammer)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자면 수집가들이 여기저기서 모은 매혹적이고 진기한 물건들을 전시하는 공간이었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의 보고이다. 역사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진다. 르네상스 시대 분더캄머는 집안의 유물이었지만 역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으로서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말하자면 역사는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마음대로 선택해서 숙고하여 교훈을 뽑아낼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인류의 유산이다.
문득 드는 생각은 이 책의 역사학 개론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역사의 효용'을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혹은 역사의 매력?



역사의 의미와 효용, 그리고 매력 등에 마음이 끌린다면 크라카우어의 <역사: 끝에서 두번째 세계>(문학동네, 2012)와 앤 커소이스 등의 <역사, 진실에 대한 이야기의 이야기>(작가정신, 2013),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하위징아의 <역사의 매력>(길, 2013)과 나란히 꽂아두어도 되겠다.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역사로부터 배운다 함은 어찌 보면 선조들의 세상살이 방식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설득력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태도를 깨닫고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찾아내어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먹고사는 방식을 재고하고, 세상과 자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줄 상상의 다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다.
이 정도면 '프롤로그'로서도, 그리고 구미를 자극하는 에피타이저로서도 충분하다. 첫 장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그런데, 로먼 크르즈나릭이란 이름과는 초면이 아니다. 알랭 드 보통이 참여한 '인생학교' 시리즈의 <일>(쌤앤파커스, 2013)의 저자가 크르즈나릭이다(보통은 <섹스>를 맡았다). <원더박스>에서 다루는 열두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일'이므로 얼마간 겹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인생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도 있겠다.



퍼거슨은 어떤 퍼거슨으로 할까. <시빌라이제이션>(21세기북스, 2011)이 먼저 떠오르지만, '돈'이란 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의 지배>(민음사, 2010)나 <로스차일드>(21세기북스, 2013)의 저자와 비교해볼 수 있겠다. 식품업계의 용어로 하면 '니얼 퍼거슨 향'이 난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알랭 드 보통과 니얼 퍼거슨이 만난다는 말은 '보통 맛 + 퍼거슨 향'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는 당신이 고리를 잡고 박스를 열어볼 차례다...
13. 04. 06.






P.S. '인생학교'에 견줄 만한 시리즈는 최근에 나온 '삶의 기술' 시리즈다. 나는 에릭 로너건의 <돈이란 무엇인가>(파이카, 2013)와 토드 메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파이카, 2013)를 일단 구입했는데, 읽어보고 괜찮으면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볼 생각이다. 현재 여섯 권이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