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말판에 실린 '로쟈의 번역서 읽기'를 옮겨놓는다(이 연재는 대략 5주에 한번씩 게재된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에 대한 간략한 소감을 적었다. 인용한 대목 번역은 내가 갖고 있는 예닐곱 권의 책을 모두 참고했는데, 대동소이한 걸 제외하고 몇 개만 나열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K를 '케이'라고 음역했는데, 독어식으로 하면 '카'라고 읽어주어야 한다. 아예 '요제프 카'라고 옮긴 번역본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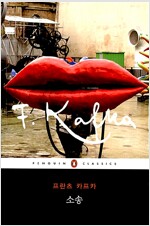


한겨레(13. 04. 06) 인간이란 사실이 죄가 될 수 없다면 나도 무죄다
“누군가 케이(K)를 중상모략한 게 분명했다.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이날 아침 느닷없이 그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세계 문학사의 유명한 서두 가운데 하나일 <소송>의 서두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체포되는 ‘케이’(K)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독자도 작품을 손에 드는 순간 케이의 부조리한 ‘소송 이야기’에 휘말리게 된다. 흥미로운 건 미완성 소설임에도 카프카가 마지막 장 ‘종말’을 ‘체포’라고 제목을 붙인 첫 장과 함께 써두었다는 점. 서른한번째 생일 전날 밤에 찾아온 두 남자에 의해 채석장으로 이끌려간 케이는 순순히 칼에 찔려 죽는다. “개 같군!”이란 말을 내뱉지만 그가 죽어도 치욕은 남을 것만 같았다는 게 마지막 문장이다.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은 케이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중상모략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숙부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도 선임해보지만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 그러다 도움을 얻기 위해 만난 화가는 케이가 법원에 대해 잘 모른다고 꼬집으면서 석방의 세 가지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실제적 무죄 판결, 외견상의 무죄 판결, 그리고 판결 지연이 그것이다. 이 중 실제적 무죄 판결은 유례가 없기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남은 건 외견상의 무죄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뿐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그 조력자가 법원과 끊임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야만 한다.
판사나 법원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연줄이 중요하기에 변호사는 의뢰인보다도 우월하게 행세한다. 케이는 지지부진한 소송 진행에 책임을 물어 변호사를 해임하러 간 자리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상인이 변호사의 환심을 사려고 구차하게 행동하는 걸 본다. ‘변호사의 개’나 다를 바 없었다. 영문을 모르더라도 일단 체포된 상황이라면 결국 두 갈래 선택지만 남는다. 외견상의 무죄 판결이나 판결 지연을 위해 힘을 써주겠다는 변호사의 ‘개’가 되거나, 그런 변호를 포기하고 개 같은 죽음을 죽거나. 분명 부조리해 보이지만 이 부조리가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데 이 작품의 문제성이 있다. 부조리의 보편성이라고 할까.



<소송>의 클라이맥스는 ‘법 앞에서’라는 우화가 포함된 ‘대성당에서’ 장이다. 교도소 전속 신부는 케이와 자리를 마련하고 소송의 경과가 좋지 않다고 일러준다. 사람들은 케이의 죄가 이미 입증된 걸로 생각하기에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거라면서. 케이는 한번 더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무죄일 수 있을까요?”(홍성광 옮김·펭귄클래식) 이 대목은 보통 다르게 번역된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권혁준 옮김·문학동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김재혁 옮김·열린책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이주동 옮김·솔)
무죄를 주장하는 케이의 논거는 특이하게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면 자신도 무죄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케이가 유죄라면 인간도 유죄라는 뜻도 된다. 그런 점에서 케이는 ‘단독적 보편성’을 체현하는 인물이다. <소송>을 읽으며 아무래도 좋지 않은 소송에 말려든 느낌이다.
13. 0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