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96호)의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의 <부채인간>(메디치, 2012)을 읽고 쓴 것인데, 라자라토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탈리아 철학자로 국내엔 <비물질노동과 다중>(갈무리, 200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갈무리, 1997) 등의 공저를 통해서 알려졌으며 <부채인간>은 처음 소개되는 단독저작이다. 시론적인 성격의 소책자라서 다소 아쉬운데(<피로사회>와 함께 올해의 주목할 만한 소책자다), 문제의식을 좀더 확장시킨 책이 나오면 좋겠다...



주간경향(12. 10. 16) 우리는 모두 부채인간이다
경제기사를 읽다가 가끔씩 고개를 갸웃거릴 때가 있다. 부채 혹은 채무와 관련한 기사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이름 중 하나가 ‘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국가부채 또한 100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의 가계와 국가 모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다. 두 가지가 궁금하다. 과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와 이 많은 부채의 채권자는 누구인지다.

그런 궁금증을 품고 있었기에 <부채인간>(메디치, 2012)에 바로 손이 갈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제목 자체에 끌렸고 ‘인간의 억압 조건에 관한 철학 에세이’란 소개가 기대를 갖게 했다. 저자의 기본 발상은 현재의 경제를 ‘금융경제’나 ‘금융 자본주의’란 말 대신에 ‘부채경제’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경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는 더 이상 자본가와 노동자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이다. 이때 자본은 ‘거대한 채권자’, ‘포괄적 채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금융과 생산을 더 이상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르러 ‘금융’이란 말은 채권자-채무자 관계의 부상을 특별히 부각시켜주는 표현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경제는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구현해 왔다. 그 결과 ‘채무자’의 형상으로서 ‘부채인간’이 공공영역을 대표하는 주체의 형상이 됐다. “우리는 모두 부채인간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공공부채의 급증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 관련 지출의 금융구조 개선과 맞물린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한다. 흥미로운 것은 공공부채를 마련할 때 중앙은행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이 시기에 유럽의 모든 정부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자금은 ‘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가가 무이자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1974년에 이 법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이후에 공공부채 총액이 16조410억 유로, 이자총액만 약 12조 유로에 이르렀다. 2007년에 500억 유로를 넘어선 이자비용은 프랑스의 국가 예산 가운데 교육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소득세 전체와 맞먹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1979년의 석유파동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막대한 공공적자가 발생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총액이 510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 한마디로 부채경제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는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다. 게다가 부채경제는 사회적 연대와 권리 주장 같은 집단행동을 무력화하기에 대단히 정치적이기도 하다. 요컨대 ‘산업과 채무자 중심의 포디즘 메커니즘’으로부터 ‘금융과 채권자 중심의 금융 메커니즘 시대’로의 이행이 부채경제의 전면적인 성립 배경이다.



저자는 니체의 <도덕의 계보>를 통해서 부채인간의 계보학적 형성과정 또한 탐구한다. 니체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오래되고 원천적인 사회적 관계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라고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곧 자신을 보증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동체의 주된 임무다. 현대 자본주의야말로 니체의 이러한 ‘약속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견해낸 것처럼 보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에 등장하는 채권추심원 이강도야말로 인격화한 자본주의의 형상 아닌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몰아넣는 권력장치”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협박경제’이고 부채경제다.
12.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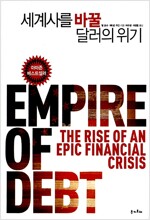

P.S. '부채'는 '증여'와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부채, 그 첫 5,000년>(부글북스, 2011)와 애디슨 위긴 등의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원제는 '부채의 제국')>(돈키호테, 2006) 등을 더 읽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라자리토의 <부채인간>은 <부채인간의 형성>이란 제목으로 영역돼 있는데, 번역본이 잘 안 읽히는 대목들에서 도움을 받았다.
가령 "정치적으로, 부채경제는 금융이나 금융화된 경제 혹은 금융 자본주의라 불리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48쪽)는 대목은 거꾸로 옮긴 오역이다(영역으로는 "Politically, the debt economy seems to be a more appropriate term than finance or financialized economy, not to mention financial capitalism). 이 대목의 절 제목 자체가 '왜 금융경제가 아닌 부채경제에 대해 말하는가'인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자의 핵심 주장은 '금융경제'란 말 대신에 '부채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실상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