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손에서 못 놓고 있는 책은 위화의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문학동네, 2012)이다(이하 <사람의 목소리>). '중국을 말하다'란 리스트를 만들 때만 해도 한두 장을 읽었을 뿐이지만, 책을 거의 읽은 지금은, 아니 반도 안 읽었을 때부터 내게는 '올해의 책' 가운데 하나로 각인됐다. 연말에 다섯 권의 책을 꼽는다면 사사키 아타루의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자음과모음, 2012)과 함께 이 두 권이 '확정'이다. 소위 '중국 당대사'에 대해서 이만한 실감을 전해준 책을 나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중국에 관한 독서량이 많지 않다 치더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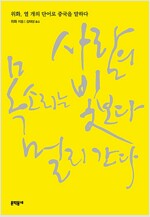


하여 이미 소장하고 있는 책도 여럿 되지만, '위화의 모든 책'을 새삼스레 구하게 됐다. 사실 산문집은 <영혼의 식사>(휴머니스트, 2008)를 좀 읽었더랬지만, 이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다. 아마도 일상의 좀 자잘한 소재들에 관한 산문들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뒷부분까지는 읽지 않았으므로 분위기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열 개의 단어'로 중국을 말한다는,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은 컨셉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슬픔과 부조리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뒷표지에 실린 평 가운데 공감하게 되는 것을 옮기자면, "한편으르는 배꼽 빠지게 재미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을 주면서도 충격적인 소설을 찾기란 힘들다. 논픽션에서 그런 작품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위화의 이 책은 바로 그런 놀라운 책이다."(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
그런 논픽션이 또 없을까 싶어 책장을 훑어보다가 빼온 책이 장리자의 <중국 만세!>(현암사, 2011)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공장의 여성 노동자였다가 현재는 영어권 저널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가 된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다. 위화가 60년생이고 장리자가 64년생이니까 여동생뻘이고, 얼추 비슷한 시대를 살았으니 중복되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겹쳐 읽으면 중국에 대한 좀더 입체적인 이해를 갖게 해주지 않을까 싶다.(사실은 루쉰 전집과 펄벅의 <대지> 3부작에도 손을 대고 있다.)



'위화의 모든 책'을 읽는 것과는 별도로 문화대혁명 시기와 그 이후의 중국에 대해서, 곧 당대 중국에 대해서 더 읽어보기 위해 몇 권의 책을 더 구했다. 모리스 마이스너의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이산, 2004)와 필립 판의 <마오의 제국>(말글빛냄, 2010) 같은 책들이다. 참고로 마오의 중국과 덩샤오핑의 중국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위화는 이렇게 말한다.
사회형태의 각도에서 볼 때, 문화대혁명 시기는 아주 단순한 시대였던 데 반해 오늘날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이다. 마오쩌둥이 말한 "우리는 적이 반대하는 것을 옹호해야 하고, 적이 옹호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라는 한마디로 문화대혁명 시대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이처럼 흑백이 분명한 시대였다.(...) 마오쩌둥 이후에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고양이가 훌륭한 고양이다"라고 한 덩샤오핑의 말이 오늘날 변화한 시대의 기본적 특징을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이 한마디는 마오쩌둥의 사회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이리하여 중국은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마오쩌둥의 흑백 시대에서 덩샤오핑의 경제지상주의 컬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우리는 항상 "사회주의의 풀을 뜯어 먹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이 사회주의이고 어떤 것이 자본주의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풀과 싹 둘 다 똑같은 식물일 뿐이다.(202-3쪽)
하지만 이러한 차이의 식별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의 연속성이다. 지젝도 문화대혁명의 실패가 자본주의의 폭발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화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역시나 같은 통찰을 내놓는다. 하긴 위화만의 생각도 아니다.
혁명은 처음에는 한 차례 또 한 차례 이어지는 정치운동으로 표현되다가 대약진 시기와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 뒤로 중국은 개혁개방을 알리며 세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혁명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기적에서도 혁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환골탈태하여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중국의 경제기적 안에는 대약진 혁명운동도 있고 문화대혁명식 혁명폭력도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221-2쪽)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위화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하튼 '올해의 책'을 또 한권 발견한 감동을(읽다가 눈물이 난 대목도 있다) 억누르기 어려워 시간의 곤궁 속에서도 몇자 적었다...
12. 09. 16.



P.S. <사람의 목소리>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부친 서문에 보면 이 책의 "중국어판은 2011년 1월 타이완에서 출판되었고 중국 대륙에서는 아직 출판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적었다. 타이완 기자가 <형제>와 이 책이 모두 상당한 비판정신을 담고 있는데, 어째서 후자만 중국에서 출판이 불가능한가라고 묻자 위화는 그것이 허구와 비허구의 차이라고 답했다. <허삼관 매혈기>나 <형제> 등 그의 장편소설 독자라면 이 책은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더더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