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사인(257호)의 '여름의 책꽂이'에 실은 리뷰를 옮겨놓는다. '책꽂이'는 분기별 서평 코너로 일년에 한 차례 정도 이 코너에 쓰는 듯싶다. 몇 권의 후보 가운데 내가 고른 책은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부키, 2012)이다. 무더위가 겹쳐서 생각보다 힘들게 읽은 책이다. 하긴 저임금 노동의 힘겨운 실상을 다룬 책이기도 하다. <노동의 배신>은 <빈곤의 경제>(청림출판, 2002)라고 출간된 적이 있는데 원저의 2001년 초판을 옮긴 것이다. <노동의 배신>은 그 10년 뒤에 나온 2011년판을 옮긴 것으로 저자의 후기가 덧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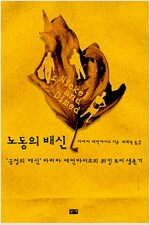


시사IN(12. 08. 18) 열심히 일해도 지킬 수 없는 삶
국내에서는 ‘행복전도사’들을 통렬하게 비판한 <긍정의 배신>을 통해 처음 주목받은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부키, 2012)은 2001년에 출간된 저자의 대표작이다. ‘워킹 푸어 생존기’란 문구가 책의 ‘장르’를 잘 말해준다. 생물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가 50대 후반의 나이에 저임금 노동의 실상을 직접 겪고 쓴 일종의 ‘체험 삶의 현장’이다. 시간당 6-7달러의 임금을 받고서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그러듯이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1998-2000년에 3개 도시에서 식당 웨이트리스, 호텔 객실 청소부, 요양원 보조원, 할인마트 매장 직원 등 6가지 일을 경험한다.
사실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다. 1998년 전국노숙자연합에서는 시간당 8달러 89센트는 받아야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침실이 하나 딸린 아파트에 살 수 있다고 발표했고, 한 공공정책 연구센터에서는 복지혜택을 받던 사람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구할 확률이 9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종합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과학자적 호기심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30퍼센트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혹 남모르는 생존 비법이라도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무모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긴다.
저자의 생존기 혹은 생존 투쟁기를 읽어나가면서 독자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일단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업이라도 ‘아무 기술도 필요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각 직장은 나름대로 사회를 구성하며 고유의 분위기와 위계질서, 관습, 기준 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고된 일이었다. 수년 동안 역기와 에어로빅으로 단련한 건강한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까지 맡아야 했다면 포기하고 말았을 거라고 말한다.

문제는 생활이었다.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돈에 쪼들리게 만드는 어떠한 사치나 낭비도 하지 않았지만 어렵게 번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숙식을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임금은 너무 낮고 집세는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저자처럼 딸린 가족이 없는 홀몸에 건강하고 차까지 가진 형편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노동의 현실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더라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의 의미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미국만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의 워킹 푸어를 다룬 책도 없지는 않다. 현직 기자들이 발로 쓴 <4천원 인생>(한겨레출판, 2010)도 한국판 <노동의 배신>이라 부름직한 책이다. 하지만 차이는 책이 아니라 독자에 있다. 2011년판에 부친 후기에서 에런라이크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제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책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도 했다니 책의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워킹 푸어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독서다.
12.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