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72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류동민 교수의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위즈덤하우스, 2012)를 읽고 쓴 것이다. 지난번에 폴라니의 살림/살이 경제학에 관한 책을 다루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골라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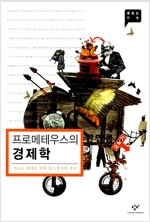

주간경향(12. 04. 24) ‘인문학자’ 마르크스가 말하는 ‘소외’
지금 우리가 마르크스를 읽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류동민의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를 손에 든 독자라면 던져봄직한 물음이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저자의 물음이자 화두이기도 하다. 어떤 ‘지금’인가? 젊은 청춘들이 “결국 극소수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한, 끝없는 스펙 쌓기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는” 지금이다. 저자가 보기에 이런 현실에서 청춘은 원래 그러한 것이라는 위로나 유머의 정치학으로 맞서보라는 충고는 공허하다. 20대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겠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프니까 마르크스다.”
류동민 교수는 마르크스 경제학, 구체적으론 노동가치론 연구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소위 마르크스 전문가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의도한 <프로메테우스의 경제학>(창비·2009)에서 자신의 연구자적 관심은 마르크스 경제학도 “자본주의 경제의 움직임을 엄밀한 수학적 논리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이 사변적이고 거칠기만 할 뿐이라는 통념을 반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자본론>에 나타난 경제이론을 현대경제학의 수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일본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의 <맑스의 경제학>(나남·2010)을 번역해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류경제학에 상응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사랑과 희망의 인문학 강의’를 표방한 <마르크스가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는 그 과학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마르크스에게 접근한다. ‘사회과학자’ 마르크스가 아니라 ‘인문학자’ 마르크스다. 거기에는 “사회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전망을 결합하고자 했던 보기 드문 사상가”가 마르크스라는 평가가 전제돼 있다. 이때 인문학적 관심과 전망은 무엇보다도 ‘소외된 개인’의 발견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어느 낯선 파티장에서 마땅한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해 어색한 포즈로 기웃거리는 상황을 떠올려보라고 말한다. 그런 ‘낯설어지는 느낌’을 가리키는 말이 소외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부제도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인 걸 고려하면 이 소외감은 이 시대 청춘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그런데 이 소외를 기본적 문제로 인식한 ‘소외의 철학자’가 바로 마르크스다. 마르크스에게서 인간은 고립된 실존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왕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들고 복종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즉 왕과 신하라는 사회적 관계가 없다면 왕은 왕이 아니게 된다.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질상 ‘유적 존재’다. 즉 인간은 고립되어서 살 수 없으며 “우리 개개인은 전체, 즉 인간 전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자신과 관계한다.”
이렇듯 소외가 실존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감정이라면 소외의 극복 또한 사회적 관계의 변혁을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소외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도 프롤레타리아처럼 소외되지만,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소외를 즐기며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말했다. 저자는 이 말을 보충해서 부르주아가 소외되면서도 소외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돈을 통한 소외의 향유는 소외의 극복이 아니라 회피일 따름이다. 진정한 소외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적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이다.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사유가 코뮤니스트적 사유다.
책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목은 ‘열 명의 저자와 한 편의 영화에 관한 노트’란 부록이다. 저자는 “아직 마르크스를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알랭 드 보통처럼 쓰고 싶었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자신의 체험은 많이 녹아 있지 않아서 아쉽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칵테일 잔을 들고 서성거려본 독자들이 얼마나 될까.
12. 0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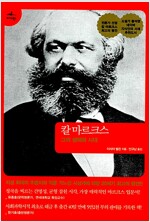


P.S. 마르크스를 읽는다면 평전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마침 절판됐던 이사야 벌린의 <칼 마르크스>(미다스북스, 2012)가 재출간됐다(벌린이 20대에 쓴 책이다). 평전으로는 프랜시스 윈의 <마르크스 평전>(푸른숲, 2001)과 다시 경합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