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교보문고의 소식지 '사람과 책'에 실은 글을 옮겨놓는다(약간 수정됐다). '정치를 읽다'란 특집 테마의 한 꼭지를 청탁 받고 쓴 것이다. 정치에 관한 책, 혹은 정치교양서에 대한 가이드로 고전 5권과 신간 5권을 골라 소개해달라는 것이 내가 받은 주문이었다.



사람과 책(12년 4월호) '장롱 주권'을 꺼내주는 정치교양서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정치 관련 서적을 읽어야 하는가? <닥치고 정치>(푸른숲)의 저자라면 간명하게 대답할 듯싶다. 우리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그 스트레스의 근원이 정치라고 지목되기 때문이다. 정치 무관심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방치이자 투항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무시당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장롱 주권’이 된다. 맘에 안 드는 정치에 대해 ‘닥쳐라! 정치’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도 ‘닥치고 정치’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해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닥치고 정치’라고 해서 우리가 맨몸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생각이 필요하다. 이 ‘정치 생각’의 불쏘시개가 돼주는 책이 정치 교양서들이다. 어떤 책들이 있는가.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책들이 있다. 정치철학서라고 분류되는 책들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플라톤의 <국가>(서광사)에 가 닿는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치철학 이전에, ‘정치란 무엇인가’란 물음 이전에 정치, 곧 정치적 행위가 존재했다. 플라톤 시대에 그 정치는 민주정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어중이떠중이들의 정치’ 정도로 간주했다.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안긴 정치가 아테네 민주정이었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불만은 이해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정치철학의 ‘기원’이 바로 정치에 대한 불만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철학’이라고 붙여 쓰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치냐 철학이냐’에 가깝다. 플라톤은 어중이떠중이들이 아닌 전문가들의 정치, 궁극적으로는 철인(哲人)의 통치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올바름’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철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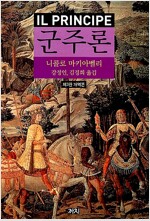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양 정치사상의 고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도서출판 숲)을 거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치)에 이른다. 고전 정치철학이 정치를 ‘올바름’의 문제와 항상 결부시켜서 사고했다면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행위가 종교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현실주의’에서 근대 정치사상은 시작된다. 우리가 ‘정치’하면 ‘올바름’보다 ‘권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건 그만큼 오늘날의 정치현실이 마키아벨리즘과 가깝기 때문일까.



그렇듯 ‘현재적인’ <군주론>에다 사회계약론적 통치관과 국가관을 대표하는 로크의 <통치론>(까치)과 홉스의 <리바이어던>(나남)까지 더 얹으면 얼추 서양 정치사상의 고전 목록은 채워진다. ‘너무도 유명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란 고전에 대한 정의에 잘 부합하는 책들이다. 아무도 안 읽는 책을 혼자만 읽으려고 하면 멋쩍을 테니 가이드를 동반하는 것도 좋겠다. 강유원의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라티오)와 애덤 스위프트의 <정치의 생각>(개마고원) 등이 그런 역할에 충실한 책들이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개)도 국가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란 시각에서 정치사상을 일람하는 데 요긴한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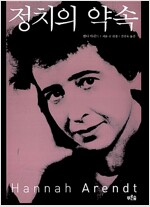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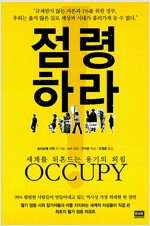
통상 플라톤의 <국가>에서부터 정치철학에 대한 독서를 시작하는 게 상례이지만 <인간의 조건>(한길사)의 저자 아렌트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지도 모른다. 아렌트는 정치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해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의 약속>(푸른숲)에서 이렇게 말한다. “정치는 인간의 복수성에 기초한다. 신은 단수의 인간(man)을 창조하였지만, 복수의 인간(men)은 인간적이며 지상에서 만들어진 산물이고, 인간 본성의 산물이다.”
그가 보기에 정치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의 문제’이다. 하지만 철학이나 신학은 모두 단수의 인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문제의식이다. 정치철학 역시 마찬가지다. 아렌트는 플라톤을 포함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정치에서만큼은 깊이 있는 통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꼬집는다. 정치가 닻을 내리고 있는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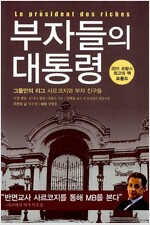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치적 사유,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너무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큰 잘못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에 집중하며, 지금 쏟아지는 책들에 주목하는 것도 방책이라면 방책이니까. 당장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두 권의 <점령하라>, 곧 월스트리트 시위를 다룬 슬라보예 지젝 외, <점령하라>(알에이치코리아)와 '시위자'의 <점령하라>(북돋음)는 자본과 1%를 위한 정부와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항의의 육성을 담고 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우리가 남이가?’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폴 피어슨과 제이콥 해커의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21세기북스)는 ‘승자독식의 정치학’이 부제다. 저자들은 지난 30년간 미국식 민주정치가 어떻게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는지 폭로한다. 거대 금융자본과 정치인들의 밀월관계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최상위 0.01%의 부유층만을 대변해왔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국 ‘부자계급을 위한 충직한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폭로한 팽송 부부의 <부자들의 대통령>(프리뷰) 또한 비슷한 성격의 책이다.



정치 선진국을 자임하는 미국이나 프랑스의 실상이 그러하다면 우리라고 고개만 숙이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모자란 건 모자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나가는 것일 테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선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대한민국의 ‘알몸’을 폭로한 김용진의 <그들은 아는, 우리만 모르는>(개마고원)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재벌들의 비리들을 들춰낸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타커스)는 무엇이 ‘현실’인지 알려준다. ‘나꼼수’ 주진우 기자의 ‘정통시사활극’ <주기자>(푸른숲)까지 이러한 폭로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현실의 좌표를 재조정하게 해줄 것이다. 이 좌표 자체를 변경할 수 있을까. ‘비정규직 주권자’처럼 선거철에만 잠시 주권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주권자’로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해나갈 때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책이 그러한 걸음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12.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