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으로 아이가 먹자고 한 동네표 피자를 먹으며 이번주 교수신문을 읽다가 몇권의 책이 눈에 띄어 주문했다. 그중 하나는 김봉률 교수의 <어두운 그리스>(경성대출판부, 2011). '사유와 젠더, 민주정의 기원'이 부제다. 저자는 영문학자로 소설발생의 기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고대 그리스에 가 닿게 됐다고. 하지만 관점은 '부정적 발견' 쪽이다.



저자의 책소개 기사에 따르면 그리스에 대한 관심은 당초 브루노 스넬의 <정신의 발견: 서구적 사유의 그리스적 기원>(까치, 2002)에 의해 촉발됐다. 고대 그리스는 정신을 발명하긴 했지만(밝은 그리스) 그것은 '자아의 폭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어두운 그리스). 저자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사유의 기원이 낳은 어두운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과도한 자아, 결핍에서 비롯된 욕망의 주체, 지나친 자기성찰 바로 이것들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의 숭상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신병리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 역시 가부장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전쟁을 만들어내는 지배력 숭상의 사유를 만들어내는 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적 사유가 고대에 한정된 '유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론 프랑스혁명과 제국주의를 통해서 부활한 그리스, 특히 아테네적 사유는 나치즘과 네온콘 사상으로 이어졌다. "이 '밝은 그리스'가 근대 파시즘의 고향인 것이다. 따라서 '어두운 그리스'는 마틴 버날의 '블랙 아테나'와 만나는 지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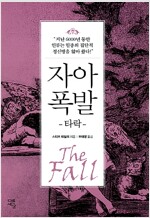


저자가 주장하는 '어두운 그리스'의 세가지 핵심을 부제에 따라 정리하면, 먼저 '아레테(탁월성)'에 대한 숭상이다. 이 문화는 "뛰어난 자에게 타자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로 요약되며, 전쟁은 그 자유의 절정이다. 남성적 자유의 실현 장으로서 전쟁은 가부장제 또한 노골적으로 정당화한다. 저자는 '젠더의 기원'을 통해 "가부장제의 제도화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과 함께 간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신통기>를 사례로 든다. 더불어 "문화의 시대인 페리클레스 시대는 남근이 지배적 키워드로 남근을 발기한 헤르메스 신상이 집집마다 대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 역시 남근지배와 민주정, 침략주의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정'의 기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떤 훌륭한 제도라도 그것이 전쟁으로 수렴되면 비판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그리고 당연히 궁극적으로 '밝은 그리스는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박노자 버전으로 말하면 '당신을 위한 그리스는 없다'? 저자에 따르면 전쟁기계로서 국가'를 발명해낸 것도 '어두운 그리스'라 봄직하다). 너무 비관적인가? "하지만 이런 부정과 회의는 고대 그리스 이후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살아온 사회와 다른 사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고민과 상상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저자는 적는다.



이번 학기에 맡게 된 강의에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고전들을 다시 읽어볼 예정이라 좋은 참고가 될 듯싶다. 개인적으론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읽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관련서들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어두운 그리스>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재판>(작가정신, 2005)과 <소크라테스의 비밀>(간디서원, 2006)도 같이 주문했다. 이미 진즉부터 '어두운 그리스'를 주장해온 박홍규 교수의 <소크라테스 두 번 죽이기>(필맥, 2005)도 두 번 읽어봐야겠다...
12. 03. 01.



P.S. 정치철학에서 시카고학파의 좌장이자 네오콘의 대부격으로 불리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책도 몇권 꺼내놓을 참이다. 그가 편집한 <서양정치철학사1>(인간사랑, 2010), <자연권과 역사>(인간사랑, 2001),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 2002) 등이다.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는 벌써 품절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