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58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지난 연말에 쓴 것으로 변광배 교수의 <나눔은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프로네시스, 2011)를 다루었다. 모스의 <증여론>과 고들리에의 <증여의 수수께끼> 등을 읽던 참이어서 손이 간 책이다. 참고문헌에는 언급돼 있지만 <증여의 수수께끼>는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더불어 증여의 인류학에 대해서 저자가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흠이다. 증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나카자와 신이치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4)나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그린비,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주간경향(12. 01. 10) 순수한 기부의 조건 ‘익명성’
기부 혹은 사회적 나눔에도 철학이 있을까? ‘기부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효과적인 실천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쓰인 변광배 교수의 <나눔은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는 부제대로 ‘모스에서 사르트르까지 기부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살펴본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를 전공한 저자는 미완의 유고 <도덕을 위한 노트>가 출간된 걸 계기로 기부행위를 핵심으로 한 사르트르의 도덕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와 철학자 조르주 바타유,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기부에 대한 철학을 검토하면서 사르트르를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다.
저자가 주로 ‘기부’라고 옮긴 단어는 ‘증여’ ‘선물’이란 뜻도 갖는데, 이 주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모스의 <증여론>이다. 모스는 원시사회의 증여 혹은 기부현상을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법적 측면의 의미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 이해했다. 저자는 모스가 증여행위에서 ‘주어야 하는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답례해야 하는 의무’라는 세 가지 의무를 발견한 데 주목하여 “기부행위 역시 궁극적으로는 답례, 곧 대가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교환에 불과하다는 것이 모스의 견해”라고 정리한다. 그런 점에서 ‘순수한 기부는 없다’는 것이 저자가 이해하는 <증여론>의 요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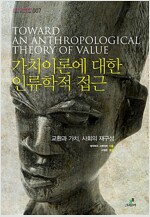
반면에 모스의 영향을 받은 바타유는 ‘기부는 순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가령 손님들을 초대해 과도하게 접대하고 선물을 주는 북미 인디언 부족의 포틀래치 의식은 경쟁자에게 모욕을 주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됐다. 그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야 했다. 하지만 바타유는 상대방의 답례를 전제로 한 포틀래치, 권력과 우월한 지위를 생산하고 확인하기 위한 포틀래치를 거부한다. 그가 보기에 포틀래치의 이상은 돌려받지 않는 데 있다. 즉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서 무언가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기부 수혜자 역시 답례의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요컨대 바타유가 원한 건 포틀래치를 넘어선 포틀래치, ‘절대 순수 기부’였다.
해체의 철학자로 유명한 데리다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대해서 살핀다. 기부가 경제적 교환행위로 환원되지 않으려면 기부자와 기부 수혜자는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인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점이다. 그렇게 인지하는 순간 양자는 답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부는 교환으로 전락한다. 가령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너무 까다로운 조건인가. 때문에 데리다가 보기에 기부란 찰나적 순간에만 존재한다. 예컨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몸에 칼을 대려는 순간, 이 ‘절대적 포기’의 순간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순수한 기부행위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행위가 일상생활에서도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기부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여정에서 저자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르트르의 기부론이다. 흔히 기부행위에서 기부자는 주체로 올라서는 반면에 기부 수혜자는 객체의 위치로 떨어진다. 우리의 사회면 기사에서도 기부자의 이름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보기에 그것은 기부의 부정적 측면이자 독성이다. 어떻게 이 독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사르트르의 제안은 기부자의 ‘이름’을 빼는 것이다. 기부 수혜자의 주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답례의 의무도 지우지 않는 방책이 익명의 기부다. 그럴 때만 기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로 고양되며, 기부자는 과시적 명예의 획득 대신에 ‘익명의 보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부행위의 순수성 문제를 화두로 한 철학적 성찰의 결론이 ‘익명성’으로 모아진다면 우리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자가 책의 말미에서 화상(火傷) 환자들을 위해 매일 1000원씩 후원금을 기부한 포장마차 주인의 사례를 들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기부천사’는 자신의 얘기를 “미담으로 포장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철학자들의 얘기를 우회했지만 사실 기부의 철학은 멀리 있지 않다.
12.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