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지 공간(526호)에 실은 리뷰를 옮겨놓는다. 매클래치의 <걸작의 공간>(마음산책, 2011)을 거리로 삼았다. 작가들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조심스레 책장을 넘겨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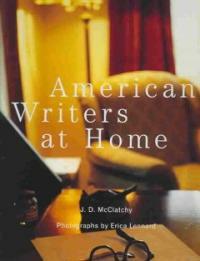
공간(11년 9월호) 걸작의 공간
문학의 거장들은 어떤 집에서 살면서 글을 썼을까. ‘작가의 집’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집’보다는 ‘작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들의 사색과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작이 이루어진 공간에 대한 관심이다. 시인이자 예일대 영문학과 교수인 J. A. 매클래치의 <걸작의 공간>은 미국 문학사를 수놓은 대표적인 작가들의 집에 대한 ‘방문기’다. 원제는 ‘미국 작가들의 집(American Writers at Home)’이고, 번역본에는 ‘작가의 집에 대한 인간적인 기록’이란 부제가 붙었다. 화보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풍부한 사진자료들이 이 기록에 실감을 부여한다.
<작은 아씨들>의 저자 루이자 메이 올컷의 집 ‘오차드 하우스’에서 시작해 <풀잎>의 시인 월트 휘트먼의 ‘월트 휘트먼 하우스’까지 둘러보는 ‘미국 작가들의 집’ 방문기에서 저자가 특별히 방점을 찍는 건 ‘미국’이다. “미국은 항상 은둔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고립된 사람들의 나라”였다는 생각에서다. 미국 작가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기에 그런 운명에서 비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는 “끊임없이 들썩이는 기복이 심한 나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삶을 영위하고 무엇보다 일을 하는 장소로서 자기들의 집을 어디에, 무슨 이유로, 또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한다. 작가의 집은 미국적 삶과 창작이 서로를 비춰주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자가 안내하는 작가의 집은 21곳인데, 어떤 차례가 있는 건 아니다. 그의 걸음을 따라가는 독자도 마찬가지여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집부터 먼저 둘러볼 수도 있고, 새러 오언 주잇(Sarah Orne Jewett)이나 플래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or)처럼 국내 독자들에겐 생소한 이들의 집을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무작정 찾아가볼 수도 있다. 일단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공통점이다. 책상이 놓여 있는 서재와 거실, 그리고 침실 등 예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방문객 독자를 맞이한다. 허먼 멜빌의 책상에 붙은 설명처럼 “어떤 작가의 집이든 중심에는 책상이 있다. 장식적이든 평범하든, 책상과 그것을 둘러싼 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아려한 아이디어나 마무리되지 못한 문단, 어른거리는 시의 연이 되고, 어쩌면 이미 출간된 책들을 가까이 둔 고요한 책장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책상들에서 <모비딕>과 <허클베리 핀의 모험>, <8월의 빛> 등이 쓰였다고 하면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모두가 명작의 산실이란 점에선 공통적이긴 하지만 작가의 집은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그 개성은 그 주인의 개성을 닮은 것이다.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는 성격의 헤밍웨이는 종군기자로도 맹활약을 했던 만큼 전선의 참호도 창작의 공간으로 떠올리기 쉽지만 그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대표작은 플로리다의 키웨스트에서 쓰였다. 이 저택은 넓은 터에 스페인 식민지 양식으로 지어졌다. 헤밍웨이는 간결하고 건조한 스타일의 문장을 구사했지만 그의 집은 녹음이 무성하고 야자수가 우거졌다.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사고도 치고 폭음을 했지만 헤밍웨이는 ‘훈련된 작가’였고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매일 아침 8시에 책상에 앉아서 오전 내내 글을 썼다. 그렇지만 결혼생활은 불안정해서 네 차례나 결혼하고 1954년 노벨상 수락연설에서 “글쓰기는, 기껏 잘해야 고독한 삶이다”라고 말한 작가가 헤밍웨이였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집으로는 코네티컷의 하트포드에 있는 마크 트웨인의 저택이 손꼽힌다. “나는 평범한 미국인이 아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미국인이다.”라고 말한 트웨인은 ‘증기선과 뻐꾸기시계 중간쯤의 모습’을 한 이 집을 가장 아꼈다. 3층에 있는 서재에는 당구대가 놓여 있어서 트웨인은 즐겨 게임을 하면서 아이디어와 플롯을 가다듬었다. 그는 아침을 거나하게 먹고 오전 11시경에 서재로 올라가서 저녁때까지 온종일 일하고 그렇게 쓴 작품을 가족들에게 읽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만년은 불행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파산한 상태에서 가장 아끼던 딸을 척수막염으로 잃은 그는 충격과 비탄에 빠졌고 하트포드의 집도 마침내는 처분했다. 트웨인은 “유머의 은밀한 근원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고 말했다.

가장 슬픈 인생을 산 작가로는 허먼 멜빌도 뒤지지 않는다. 그가 산 집은 매사추세츠의 피츠필드에 있다. 자신이 ‘애로헤드(화살촉)’이라고 이름붙인 이 집에서 멜빌은 아침 8시에 일어나 헛간으로 가서 암소에게 호박 한두 개를 썰어주고 소가 고결하게 턱을 움직이며 먹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작업실로 가서 일을 했다. 그는 거대한 그레이록산의 고래 같은 형태를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모비딕>을 완성한다. 그의 나이 겨우 서른둘의 일이다. 하지만 그가 이 작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556.37달러였고, 이후에 결국 작가로서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 일당 4달러의 세관원으로 근무한다. 그가 사망했을 때 <뉴욕타임스>의 부고란에는 “전에 작가였던 인물” ‘헨리 멜빌’이 죽었다고 짤막하게 언급됐다.
작가들의 집이 대개 시골에 있다는 점이 혹 눈에 띌지 모르겠다. 창작의 공간으로서 번잡한 도시보다는 조용한 시골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도시에 살았던 작가들의 집이 도시 재개발이나 새로운 집주인의 냉대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일례로 <분노의 포도>의 작가 스타인벡의 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새 주인은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한다. 책을 덮으며 한국 작가들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마구잡이 개발로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 목록에 ‘걸작의 공간’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1.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