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책을 읽을 자유'란 제목이 눈에 띄어 칼럼 하나를 옮겨놓는다. 이택광 교수의 '인문학 칼럼'이다. <책을 읽을 자유>(현암사, 2010)도 언급돼 있는데, 말하자면 '철학책을 읽을 자유'는 '책을 읽을 자유'의 하위범주가 된다.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국제신문(11. 03. 30) 철학책을 읽을 자유
철학자라는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실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철학자는 오늘날 결코 환영받을 수 있는 인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자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지(智)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남녀관계도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과잉의 상태이다. 지에 대한 과잉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란 누구겠는가. 한마디로 지적 행위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철학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급급한 평범한 사람에게 철학은 쓸데없는 고민을 만들어내는 귀찮은 행위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앎에 대한 욕망에 빠지면 세속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남들이 좋은 차를 사거나 멋진 집을 사기 위해 고심할 때 철학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골몰하면서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가디언'지의 질문에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 지젝이 '헤겔 전집'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래서 단순한 위악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돈으로 40만 원가량인 전집을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심리'를 짐작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누구나 쉽게 지젝과 같은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에 서평블로거 로쟈 이현우가 출간한 책은 '책을 읽을 자유'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모든 존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이현우에게 그 자유는 무엇보다도 '책을 읽을 자유'인 것이다. 이 의미심장한 '자기주장'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영국 유학 시절 소속 학과사무실 게시판에 유명 출판사의 채용공고가 자주 붙곤 했는데 지원자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인상 깊은 지원자격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다. 컴퓨터회사라면 당연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자격규정은 사실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자격요건을 밝혀 놓은 까닭은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이 의미 있는 자질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책을 읽을 자유'는 그렇게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적 여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직장인들은 업무에 쫓겨서 어렵고, 학생들은 그 못지않게 스펙 쌓는 일에 바빠서 못한다. 이런 사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업무'나 '스펙'과 관계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철학'이라는 지를 사랑하는 특이한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철학과를 가겠다는 자식을 말리지 않을 부모가 과연 한국 사회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철학의 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파리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카페나 공원에서 철학과 관련한 토론이 벌어지는 일도 아주 흔하다. 이런 프랑스의 지적 풍토를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프랑스가 독일을 제치고 철학의 나라로 거듭 난 것은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필수적으로 철학을 이수해야하는 교육제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철학에 대한 기초지식 정도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최근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도 프랑스처럼 제도적 뒷받침과 결합한다면 일시적 유행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인문학을 자신의 삶에서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 지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시혜적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철학적 화두로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각자의 삶에 하나씩 품을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제도화도 뜬금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까닭에 '철학책'을 읽을 자유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다.(이택광_경희대 영문학과 교수)
11.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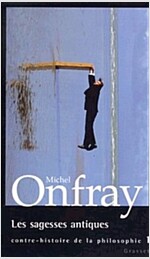


P.S. 최근에 '철학책을 읽을 자유'의 향유대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철학자는 미셸 옹프레이다. <반철학사4: 계몽주의 시대의 급진철학자들>(인간사랑, 2010)에 이어서 <반철학사3: 바로크의 자유사상가들>(인간사랑, 2011)이 출간됐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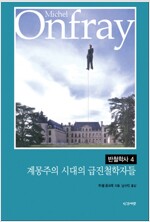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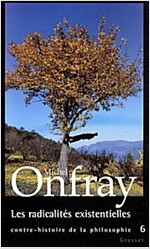
프랑스에서 철학교사로 오래 근무한 이 철학자의 '반(反)철학사'는 전체가 6권으로 예정돼 있는데, <바로크의 자유사상가들> 이전에 <반철학사1: 고대의 현자들>, <반철학사2: 크리스트교적 쾌락주의>가 배치돼 있고, <계몽주의 시대의 급진철학자들> 이후에는 <반철학사5: 사회적 행복주의>와 <반철학사6: 욕망하는 기계>(이상 가제)가 뒤를 받치게 된다. 철학적이라기보다는 미학적인 표지가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