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당일배송으로 받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 펭귄판 원서(2010)와 50% 할인 중인 어슐러 르귄의 <어둠의 왼손>(시공사, 2009), 그리고 영국의 여행기 작가 콜린 더브런의 <순수와 구원의 대지 시베리아>(까치, 2010)다.


더브런의 책은 큰 기대 없이 '시베리아' 여행기라고 하기에, 그리고 마침 당일배송이 되기에 주문한 책인데, 의외의 수확이다. 몰랐지만 저자는 '금세기 최고의 여행기 작가'로도 불리는 인물이고 책은 그의 '최고작'이란 평판도 얻고 있다. 오늘자 한겨레의 '잠깐독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됐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미국과 알래스카를 합한 땅보다 더 큰 시베리아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담고 있다. 지은이는 우랄산맥의 동쪽 시베리아가 시작되는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출발해 동북쪽 항구도시 마가단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1만2천㎞를 누비며 시베리아를 넓고 깊게 담았다.
책은 잿빛이다. 유배, 수용소, 강제노동, 죽음 등의 단어로 상징되는 역사에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민초들의 육성이 생생하게 실려 있기 때문이다. 여행 당시 러시아는 소련 해체 직후여서 극심한 혼란과 빈곤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었다. 몇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잔뜩 화가 난 과학도시의 행정책임자,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젊은이 등. 러시아정교회의 한 신부는 가난과 혼란을 공산당 통치기인 ‘잃어버린 70년’에서 찾았다. 텅 빈 도시 중심가를 오가는 실업자, 주정뱅이, 성매매를 권하는 여성, 그리고 러시아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는 마피아 등은 옐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럼에도 책은 재미있다. 박학다식과 글솜씨는 비운의 역사를 흥미진진한 영화나 드라마로 바꿔놓는다. 독자들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비극적 종말을 보고, 중서부 과학도시 아카뎀고로도크에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제일 강국을 꿈꾸던 소련의 야망을 만난다.
하지만 잠깐 읽고 말 책은 아니어서 책을 손에 드니 부듯하다. 내친 김에 작년에 소개된 <살아있는 길, 실크로드 240일>까치, 2009)도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저자의 '뒷조사'를 좀 했다. 그건 그의 전작 가운데 <러시아인들 사이에서(Among the Russians )>(1983)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

애초에 <다마스쿠스의 거울>(1967), <예루살렘>(1969) 등 중동지역 여행기로 작가의 대열에 선 더브런은 러시아와 중국, 중앙아시아 쪽으로 관심지역을 점점 넓혀갔다. 러시아 지역에 관해서는 소위 '스탄' 지역 여행기 <아시아의 잃어버린 심장>(1994)도 쓴 바 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와 <시베리아>(1999)까지 포함하여 그의 '러시아 3부작'이라고 해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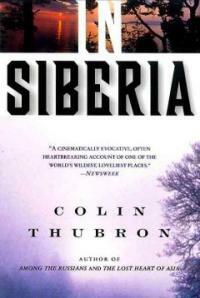
'컬렉터'의 욕심은 이럴 때 발동하는 것이어서 미국에 가 있는 후배에게 더브런의 책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알라딘에서 구할 수 없다). 중고서점에는 1-2달러에도 나와 있을지 모르기에. 그리고는 내심 올 여름 휴가지를 시베리아로 정했다.



제임스 포사이스의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솔출판사, 2009)와 김창진 교수의 <시베리아 예찬>(이룸, 2007), 그리고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의 <데르수 우잘라>(갈라파고스, 2005)도 아직 안 읽은 책이다(어디다 둔 것일까?). 이 정도만 돼도 시베리아 여행 기분은 충분히 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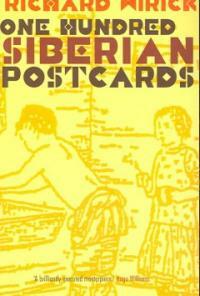
그러고 보니 리처드 워릭의 <시베리아에서 온 엽서>란 책도 올 여름 근간 도서다(나는 번역 초고를 읽고 있다).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베리아가 그리 낯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안녕, 시베리아?..
10. 07. 17.
P.S. <순수와 구원의 대지 시베리아>의 역자는 '역자 후기'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이 책이 나오는 때가 마침 한여름인지라, 독자들이 이열치열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엄동설한으로 제대로 한더위를 이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번역자는 자위한다."
적어도 나에겐 역자의 바람이 헛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