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재택하면서 원고들과 씨름하다 보니 시간 감각도 둔해지는 듯하다.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것도 아침 나절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을 정도다. 잠시 시간을 내 북리뷰들을 훑어보았는데, 이미 주중에 소개한 책들 외에 한권만 고르라고 하면 볼프강 쉬벨부시(쉬벨부쉬, 시벨부슈)의 <뉴딜, 세 편의 드라마>(지식의풍경, 2009)이다. '문화사의 거장'이라는 저자가 이번에 다룬 주제는 부제대로 '미국의 뉴딜.무솔리니의 파시즘.독일의 나치즘'을 비교한 것이다. 관련리뷰를 스크랩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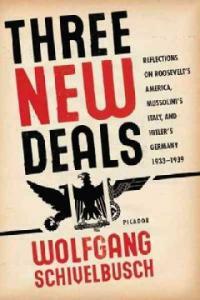
한겨레(09. 04. 25) 루스벨트-히틀러-무솔리니…당신의 상식을 의심하라
“루스벨트와 무솔리니는 피를 나눈 형제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식’을 의심할 것이다. “2차대전을 통해 자유주의를 지킨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독재의 대표인 파시스트 무솔리니는 이념의 대극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딜, 세 편의 드라마>에서 이 말이 루스벨트 스스로의 입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식’을 의심해야 한다.
<철도여행의 역사>나 <기호품의 역사> 등을 통해 문화사의 한 단면에 돋보기를 들이대던 볼프강 시벨부슈가 정치학과 역사학의 영역에서 다시 자신의 장기를 드러낸 <뉴딜…>은 읽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책이다. 이 독일 출신 지은이가 1930년대 문헌들을 찾아 루스벨트의 뉴딜과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 히틀러가 지닌 유사점을 설명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조롱받는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들 체제가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고 ‘위기에 맞선’ 거대한 기념비적 사업들을 단행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고 밝힌다. 뉴딜의 상징인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댐 건설은 독일의 아우토반, 이탈리아의 폰티네 습지 개간과 ‘상징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외에도 리더십, 선전과 언론통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세 체제가 지닌 유사함을 확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나라들에서 높은 상징성을 지닌 각종 캠페인이 강압적으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루스벨트의 블루 이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그가 집권한 해인 1933년 7월 대공황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블루 이글 배지를 옷에 달고, 가게나 공장들은 포스터를 걸도록 했다. 이 상징물이 없을 경우 ‘우리의 적’이라고 공포됐다. 당시 <데일리 헤럴드>의 한 특파원은 “독일의 스와스티카(나치 갈고리 십자가)보다 블루 이글이 더 많았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공통점은 이 체제들이 모두 이전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가 주지 못했던 것을 국민들에게 준 것이었다. 지은이는 이 체제들이 모두 ‘시장’이 아닌 ‘국민’을 중심 테제로 놓았으며,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무시받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지은이는 이 점이 이 세 체제가 공히 대공황 이후에 폭발적인 대중적 지지를 받은 이유라고 해석한다.
물론 지은이는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와 히틀러, 무솔리니는 매우 다른 정치체제를 구축했다는 점도 역시 강조한다. 특히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정치적 자유를 폭력으로 억압했으나, 루스벨트의 미국은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이들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상식’이 왜 지금은 ‘비상식’이 된 걸까? 지은이는 이를 이탈리아 및 독일과 2차대전을 치른 미국이 ‘유사성에 대한 기억’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지은이는 실제로 2차대전 이후에는 이 체제들의 유사성을 다룬 글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 현재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부와 보수 언론의 비이성적인 ‘북한 때리기’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라는 ‘우리의 상식’이 어느 틈에 ‘비상식’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밀려온다.(김보근 기자)
09. 04. 25.


P.S. 시벨부쉬의 또다른 책으로 소개됐으면 싶은 건 <패배의 문화>(2004)다. 400여 쪽 분량. 그리고 이번주 나온 책으로 뉴딜, 세 편의 드라마> 외에 한권만 더 고르라면, 마이클 화이트의 <갈릴레오>(사이언스북스, 2009)가 단연 탐나는 책이다(리뷰기사는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1587.html 참조).


그리고 3순위는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영어산책>(살림, 2009).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쓴 '미국의 거의 모든 역사'라 할 만한 책이라고(관련리뷰는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351590.html 참조). 소개에 따르면, "1994년에 펴낸 이 책의 원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한국판이 부제로 쓴 것처럼 ‘엉뚱하고 발랄한 미국의 거의 모든 역사’를 다룬 책이다. 일종의 교양 역사서라 할 이 책이 가지가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밑실은 영어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영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