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공간)>(2009년 3월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움베르토 에코의 <추의 역사>(열린책들, 2008)을 다루고 있다(작년 12월에 쓴 글이지만 다소 늦게 게재되었다).

SPACE(09년 3월호) 움베르토 에코 추(醜)의 역사를 상대해주다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는 소설가이기 이전에 세계적인 기호학자이고 철학자이지만 본래의 전공분야는 중세 철학과 문학이다. 국내에도 소개된 <중세의 미와 예술>은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가 26살 때 쓴 중세미학 연구서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에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이후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27개국에서 번역된 <미의 역사>(열린책들, 2005)만 하더라도 그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한 건 40년도 더 전인 1960년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수십 년간 대학에서 미학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가 <미의 역사> 저자로 나선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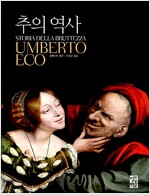
<미의 역사>에 이어서 출간된 <추의 역사>(열린책들, 2008)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에코는 유사한 책의 출판을 요청받고 ‘추의 역사’를 바로 떠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그런 주제를 다룬 책으로는 거의 최초라고 하니 조금 놀랍기까지 하다. <미의 역사>에서 에코는 ‘미’의 관념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 추적한다. 예상할 수 있는 바이지만, 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고 표상되었다. 에코는 그러한 변화의 양상과 차이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추의 역사를 상대해주겠다는 것.
미학에서 ‘미’와 ‘추’가 짝이 되는 개념인 만큼 <추의 역사>가 <미의 역사>의 짝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한데, 이 추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얼핏 미의 역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정의내린 추의 관념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말이다. 에코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듯하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추가 미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불행을 안고 있다”는 <안나 카레니나>의 서두를 흉내 내자면, 모든 아름다움은 서로가 엇비슷하지만, 추함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이 제각각의 다양성이 양적인 차원을 넘어서 미의 역사와 추의 역사라는 두 가지 역사의 질적인 차이를 낳는다.

에코의 말을 직접 빌자면, 미에 대한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오늘날 곧바로 패션쇼 무대에 설 수는 없지만, 미는 대체로 비례와 균형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즉 세기의 미녀로 꼽히던 은막의 스타 브리지트 바르도와 그레타 가르보의 코는 분명 크기와 모양새가 서로 달랐지만 일정한 길이를 넘지는 않았다. 반면에 추한 코는 피노키오의 코에서부터 넓적코, 매부리코, 비뚤어진 코, 콧구멍이 셋인 코, 종기가 많이 난 코, 술주정뱅이의 붉은 코 등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추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갖가지 추의 이미지는 미의 이미지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부하다. 그러니 추는 미와 비대칭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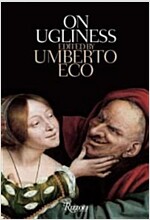
윤리학에서 악의 개념을, 법학에서 불법의 개념을, 종교학에서 원죄의 개념을 다룰 수 있듯이 미학에서 추를 ‘부정적 미’로서 다루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로젠크란츠는 1853년에 출간한 대표작 <추의 미학>(나남, 2008)에서 추를 ‘미의 지옥’이라 규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사례로서 실제로 분석하고 있는 형식의 결여와 불균형, 부조화, 외관 손상, 변형, 불쾌함의 다양한 형상들은 너무도 방대해서 단순히 미의 반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에코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추에 대한 규범적 정의와 기술은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한 것은 고대 세계의 추에서부터 중세와 바로크, 근대 세계와 아방가르드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불가능성을 낳는 다양한 추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추의 역사’가 아니라 차라리 ‘추의 분류학’에 가깝다(번역의 대본이 된 영어본은 <추에 대하여On ugliness>란 제목을 갖고 있다).
에코 자신이 이미 서문에서 미적 관념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 같은 일을 추에 관해서는 할 수 없었다고 시인한 만큼, 명태 두름 꿰듯이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추의 역사’를 책에서 읽을 수는 없다. 아쉽지만 이것은 저자 에코의 한계가 아니라 추의 특수성이다. 그럼에도 추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정도는 추에 대한 원형적인 관념으로서 유효하지 않을까 싶다. 한 가지는 고대 그리스의 관념인데, 그들은 미를 일종의 ‘완벽함’으로 정의해 미와 추는 상대적이었다. 예컨대, 제법 단련된 복근이라도 ‘보다 더 완벽한’ 복근과 비교되면 추로 간주되는 식이다. 반면에 우주 전체를 신의 작품으로 간주한 그리스도교에서는 추란 존재할 수 없다. 이 신학적 형이상학에서 추는 다만 예전에 좋았던 것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소위 ‘범미주의’적 관점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라고 보는 것일까.
09.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