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의 일거리들을 챙기기 위해 연구실에 나왔다가 권혁웅 시인의 새 시집 <그 얼굴에 입술을 대다>(민음사, 2007)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뜯는다. 이어서 이번주 <한겨레21>의 비닐 포장도 뜯고. 시인의 '연애시집'을 읽기 위해서 나란히 빼온 책들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문학동네, 2005)와 나탈리 엔지어의 <여자 - 그 내밀한 지리학>(문예출판사, 2003)이다. 이왕이면 데즈먼드 모리스의 <벌거벗은 여자>(휴먼&북스, 2004)까지 펴놓으면 좋으련만, 문득 이 책을 안 갖고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친다('당신이 없는 사이에' 나온 책들이 대개 이 모양이다).




나탈리 엔지어 책은 이번에 보니까 표지가 바뀌어 다시 나왔다. 예전 표지의 그 둔감한 이미지와 비교해보면(게다가 '회색'이었다!) 새 표지가 얼마나 잘 빠졌는지 알 수 있다(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손길이 갈 게 아닌가). 물론 원저의 표지 자체가 좀 심심하긴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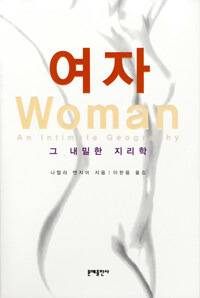

"이 책은 여성의 몸을 찬양하는 책이다"라고 시작하는 엔지어의 책은 "나는 우리가 여성적이라고 부르는 부위들을 작업 지도로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과 의학을 불러내려 한다."는 것으로 취지를 해명한다. 그리고는 "나는 우리의 내밀한 지리학의 기원을, 말하자면 왜 우리의 몸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왜 매끄럽고 둥근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꼽사납고 서툰 행동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윈과 진화론에 의지하려 한다. 나는 특정한 신체부위나 신체적 특징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찬사를 받아왔는지 파악하기 위해 역사와 미술과 문학을 뒤지지려한다..."는 식으로 나간다. 나는 이런 책이 맘에 든다. 그래서 모셔두고 있는 것인데, 문득 몇 권의 책이 더 생각난다. 우리 몸 사전류의 책들 혹은 의학서들.




여하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지만 '그 얼굴에 입술을 대기 위해서' 같이 펴들 만한 책들이다. 시인은 자서(自序)에서 "바라건대 내 입술이 그의 윤곽을 제대로 더듬었기를."이라고 적었다. '그'는 물론 '그녀'의 완곡어법이자 중성적인 어법일 테고, '윤곽을 제대로 더듬'는 것 정도가 목표라면 제목이 미리 암시해주듯이 아주 '얌전한' 연애시일 거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적어도 "우악스런 농사꾼 내 몸뚱이는 너를 파헤쳐/ 대지의 밑바닥에서 아들놈이 튀어나오게 한다"(네루다) 같은 식은 아닌 것이다(얼굴에 입술 정도 갖다대는 게 '목표'이니 말이다!). '상상동물 이야기' 시편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시집이 '연애의 상상'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닌가 싶다. 실상 '신화에 숨은 열여섯 가지 사랑의 코드'란 부제를 단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또한 온통 '신화' 이야기였던 것이니. 그 책의 서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적었다.
"사춘기 때 나는 죄의식으로 똘똘 뭉친 작고 약한 소년이었다. 교회가 내게 죄를 가르쳐주엇고 학교가 죄짓는 사람들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집은 가난하고 시그러웠다. 나는 늘 상상 속으로 달아나곤 했다. 삼국지를 읽거나 프로야구를 보며, 내가 아는 사람들을 장수나 선수로 둔갑시켜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경기를 치렀다.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무섭고 패싸움이 싫고 술주정이 혐오스럽다. 그때 시쓰기를 배웠다. 시는 내 머릿속의 상상을 거리낌없이 펼쳐내는 방법이었다. 시를 읽고 쓰다가 시에서의 비약이 바로 신화의 초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7-8쪽)
권혁웅 시의 '비밀'을 너무도 환하게 드러내놓는 고백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미노타우로스가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졌고 미궁에서 살고 젊은 처녀를 잡아먹는다 한 젊은 여자가 황소와 교접하여 그를 낳았다고 하니, 탄생의 경로도 미궁은 미궁이다"(83쪽) 같은 '신화'보다 내가 관심을 갖는 쪽은 언제나 '현실'이다. 시집의 마지막에 배치된 시 '마흔 번의 낮과 밤' 같은.
불혹은 일종의 부록이거나/ 부록의 일종이다
몸 여기저기 긴 절취선이 나 있다 꼬리를 떼어 낸 자국이다. 아무도 따라 흔들리지 않았으므로 몸은 크게 벌린 입처럼 둥글다 제 자신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 점점 커질 것이다 저녁은 그렇게 온다
그렇게 시작하는 시를 읽으니 시집 전체가 '불혹'을 맞이한 소회 내지는 위기의식으로 읽힌다(이제 배만 불룩해지는 '부록'의 여생을 살아야 하다니!). 시인은 무엇보다도 온갖 감각과 정신의 '유혹'에 민감해야 하거늘, '불혹'이라니!

해서, 요는 우리의 감각을 좀더 긴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시간은 시의 적이기도 하므로!..
0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