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에 실은 북칼럼을 옮겨놓는다. 최근 강의에서 다시 읽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1965)에 대해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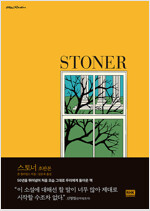


한겨레(21. 04. 16) 책에 눈뜬 인간,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
출간 당시 주목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화제가 되며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들이 있다.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1965)도 대표 사례다. 뒤이어 발표한 <아우구스투스>로 전미도서상까지 수상했지만 윌리엄스라는 이름은 오래 기억되지 않았다. 반전은 소수의 독자들에게만 입소문으로 알려지던 작품이 2000년대에 재출간되면서 이루어진다.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최고의 소설’이라는 평판과 함께 급기야는 출간 반세기 만에 ‘역주행 베스트셀러’에까지 등극한다. 윌리엄스 역시 ‘완벽한 소설을 쓴 작가’로 재조명된다.
<스토너>는 누가 읽는가에 따라 독후감이 달라지는 소설이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의 평범한 문학교수로 생을 마친 윌리엄 스토너의 일대기’가 어째서 반세기 만에 새삼스레 주목받으며 최고의 소설로까지 꼽히는가? 스토너가 영문학 교수라는 사실에서 암시를 얻을 수 있는데, <스토너>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대개 비슷한 지적 배경과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나 비평가다. 그리고 스토너와 독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책이 인생을 바꾸어놓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는 독자라면 <스토너>에 대한 찬양은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 작품 속에서도 스토너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동료 교수들로부터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스토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온도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더라도 <스토너>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따로 지목할 수 있다. 가난한 농부로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아들을 대학에 보낸 스토너의 부모를 다룬 부분이다. 지역 대학교에 농과대학이 생겼다는 군청 직원의 귀띔에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로 하는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학에서 새로운 농사기술을 배워오길 바라서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며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땅이 척박해지고 농사일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아들의 교육에 기대를 건 것이다. 일을 거들던 아들 역시 별다른 생각이나 감정 없이 대학 공부를 시작한다. 1910년의 일이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2학년이 된 스토너는 토양화학 같은 전공과목 외에 교양필수과목으로 영문학개론을 듣는다. 다른 학생들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던 담당교수에게 뭔가 끌리던 스토너는 결정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강의 시간에 책의 세계에 눈뜨게 된다.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 군. 그의 목소리가 들리나?”라는 교수의 질문이 그를 말하자면 ‘책의 인간’으로 바꾸어놓았다. 단순히 전공을 영문학으로 변경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수준을 넘어, 종교적 개종 이상 가는 존재 자체의 변화였다.
농민의 아들이었던 스토너는 책의 인간이 되면서 부모의 세계와 작별한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도 방학에는 집에 내려가 아버지를 돕고자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몫까지 해내고 있었다. 부모는 아들을 반겼고 아들 역시 부모를 사랑했지만 그들은 점차 낯선 타인들처럼 변해갔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스토너 가족의 경험은 인류사의 이행을 상기시켜준다. 서양 중세 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과 함께 새로운 은하계(책의 세계)가 탄생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라. 책의 인간이 되어가는 스토너의 변신 과정은 그러한 역사적 이행을 압축하는 이야기로도 읽힌다. 책을 읽게 된 인간은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앞두고 한번 더 되새기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