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강의의 뒤늦은 종강이 있었다(가을강의의 종강이었다!). 대개 강의가 끝나면 그때그때 쓸 거리들이 생긴다. 하지만 막상 쓰는 경우는 드물다.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서다. 그래도 가끔 일부는 적어놓는데, 이 페이퍼도 그에 해당한다. <스토너>의 작가 존 윌리엄스(1922-1994)에 대해서. 아마도 올해 번역돼 나올 것 같은 <도살자의 건널목>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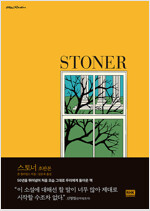

윌리엄스는 <스토너>가 50년만에 재발견되면서 '역주행'한 대표적 작가로 꼽히고 덕분에 그의 소설 두 권이 더 번역돼 나왔다. <오직 밤뿐인>과 <아우구스투스>다. <스토너>가 리커버판까지 알에이치코리아에서 출간되었는데, 다른 두 편은 구픽에서 나왔다. 짐작엔 <스토너>에 대한 반응 때문에 나머지 책들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나머지라는 게 세 권이다. 윌리엄스는 <스토너>를 포함해 단 네 권의 소설을 발표했을 뿐이다(거기에 두 권의 시집이 그의 전작을 구성한다). 연도까지 병기하면 아래순이다.
<오직 밤뿐인>(1948)
<도살자의 건널목>(1960)
<스토너>(1965)
<아우구스투스>(1972)
작품 목록만 보면 두 가지 점이 눈에 띈다. <오직 밤뿐인>부터 <도살자의 건널목>까지 좀 긴 간격이 있는 것(12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절필'한 것. 작가가 94년에 사망했으니 22년간이다. 덧붙이자면, <도살자의 건널목><스토너><아우구스투스>는 전혀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임에도 뭔가 연속적이라는 것.
강의에서 <스토너>를 다시 다루면서(두 번 강의했다) 비로소 갖게 된 생각인데, <스토너>는 그 자체로도 읽을 수 있지만, 삼부작의 한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삼부작'이 작가 윌리엄스에게는 일종의 완결판이라는 것(그 이후에 덧붙일 필요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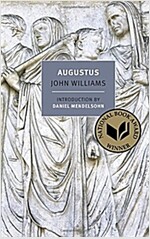
삼부작의 하나로 읽으려고 하면 아직 <스토너>를 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삼면화로 치자면 왼쪽 첫 그림에 해당하는 <도살자의 건널목>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아우구스투스>의 뒷표지에 따르면 근간 예고로 돼 있다. <아우구스투스>가 2016년에 나온 걸 고려하면 너무 늦어진다는 불길한 예감도 있지만, 여하튼 올해는 나오길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너>를 읽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작가 윌리엄스를 읽기 위해서.



<스토너>가 재발견작이라지만, 가장 높은 평판을 얻은 건 전미도서상(1973년) 수상작인 <아우구스투스>다. 특이하게도 그해에 존 바스의 <키메라>(1972)와 공동 수상했다(전미도서상 최초의 공동수상이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대표작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1971)도 비슷한 즈음에 나왔다(윌리엄스가 읽었을까?).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윌리엄스 삼부작에서 떼어내면, 동시대 작품으로는 <키메라>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과 비교해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작품이 갖고 있는 맥락이고 좌표다. 그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판단, 그리고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스토너>에 대해선 지난가을에 강의했지만, 아직 <도살자의 건널목>이 나오지 않아서 존 윌리엄스 읽기는 숙제가 되었다(책이 나온다면 올 하반기에는 강의에서 다룰 수 있겠다. 윌리엄스 소설 전체를, 혹은 삼부작을).
뒤늦은 강의소감을 간략히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