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 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는 비유는 아니지만 눈도 내린 김에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대작이 추가되었다(영화계에 쓰는 말로는 때아닌 '블록버스터'). 대작 평전 <히틀러>의 저자 이언 커쇼의 또다른 대작 <유럽>이 번역된 것. 1914년부터 2017년까지 100년에 이르는 역사를 두 권의 책에 담았다(원저도 두 권짜리다). 도널드 서순의 책까지 이어붙이면, 대략 1860년 이후 세계사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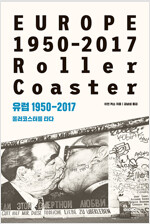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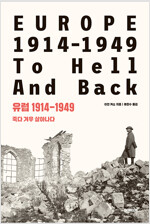

둘째권, <유럽 1950-2017>의 소개는 이렇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이언 커쇼의 <유럽 1914-1949 : 죽다 겨우 살아나다>를 뒤잇는 책으로 20세기 유럽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야심찬 프로젝트 제2권에 해당한다. 책의 부제 ‘롤러코스터를 타다’에서 드러나듯이, 저자가 바라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은 지난 70년 동안 심한 오르내림과 좌우 흔들림, 느리게 나아가다가 갑자기 빨라짐 등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처럼 극단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면서도 궤도를 이탈해 완전히 붕괴하는 일 없이 여러 도전을 겪어내면서 위태롭게 살아남은 유럽의 최근 현대사가 총 12개의 장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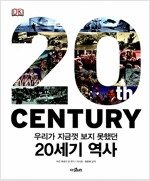
그동안 20세기 역사의 표준 역할을 해온 건 에릭 홉스봄의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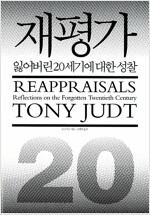
그리고 전후에 한정하면 토니 주트의 <전후 유럽 1945-2005>(<포스트워>의 개정판)이 있었다. 커쇼의 책은 이들과 같은 서가에 꽂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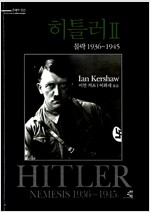
말이 나온 김에, 영어권 히틀러 평전의 결정판 <히틀러>.


독어권에서 나온 결정판으로는('결정판'이라는 말은 한시적이다. 히틀러에 관해서는 믿기진 않을 정도로 많은 책이 나오고 있어서다) 폴커 울리히의 <히틀러>가 있다(역시 두권짜리). 나는 영어판으로 구했다.


앞서, 독어권 대표 평전은 요하임 페스트의 <히틀러 평전>이었다.


커쇼의 책보다 앞서 나온 책으로는 존 톨랜드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다. 어찌하다보니 히틀러에 관한 책들도 꽤 소장하게 되었다. 개별 인물에 관한 책으로는 단연 최다 종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다(19세기 인물로는 나폴레옹?).



너무 두꺼운 책들에 질릴 때 손이 가는 책으로는 제바스티안 하프너의 책들이 있다. <히틀러에 붙이는 주석>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책. 비스마르크부터 히틀러까지의 독일 역사를 다룬 책들로는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주말에는 커쇼의 책을 손에 들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