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주로 소설들을 읽기 때문에, 시를 읽는 건 내게 휴식 같다. 원래부터 산문소설과 시는 그렇게 대비되기도 하지만. 노동과 휴식. 그렇다고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니다. 대책없는 시들이 너무 많고 요령부득의 시집도 부지기수다. 무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시집들도 허다하게 그렇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나의 기준이나 취향을 바꿀 생각은 없다. 나대로의 기준과 취향으로도 읽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시들이 없지는 않기에. 한편으론 드무니까 만날 때 기쁜 것이기도 하고.



최근에 재간본 시집 시리즈로 나온 '문학동네 포에지' 가운데(1차로 열권이 나왔다. 절판된 세계사 시집이 다수) 내게 가장 반가웠던 건 박정대의 <단편들>이다. 1997년에 초판이 나왔던 시집. 시인도 젊었고 독자로서 나도 젊었던 때다(나는 만 서른이 되기 전이고 시인은 서른을 두해 넘긴 나이였겠다).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 과거의 느낌이 낯선 시인들이 있고(최근에 다시 읽은 최승자의 시들이 그렇다. <이 시대의 사랑>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간 '사랑'처럼 보였다), 반면에 마치 어제 만난 듯 생생한 시인들이 있다. <단편들>이 그렇다.
<단편들>에 실린 모든 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편의 시들이 여전히 좋다(이 시집 이후 박정대의 시들을 나는 다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주정적이고 도취적이라는 생각이다. 나는 <단편들> 정도의 취기를 좋아하는 것). 많은 시들이 그때를 환기시켜주는데, 한편으론 왕가위 영화의 시대이기도 했다. <동사서독>의 '취생몽사' 같은 시들이 그래서 좋다. 언젠가 '물질적 황홀6'을 내가 쓴 책에 인용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조교 때 펴낸 책이었겠다.
월요일이 죽고, 화요일이 죽고 그리고
비가 내린 다음 수요일이 죽어갔다 나는 그리운
햇볕 한 조각 만나지 못하고 주말까지 계속해서 죽어갔다
세상의 물빛 머금은 모든 것들은 경건한 자세로
꽃을 피울 태세였지만 꽃의 어깨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월요일이 죽고, 화요일이 죽고
그리고 주말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려 습기 찬 들판이거나 어두운
영화관에서 팔짱을 낀 채 들꽃이 죽고 들꽃의 시선이 죽고
자막처럼 빠르게, 자동차들은 거리를, 물방울들을
튕기며 사라져갔다
(...)
다시 읽으니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박인환 시 같기도 하다(세련된 센티멘털리즘). 여긴 가식도 기교도 없다. 포즈라고 해도 괜찮은 정동, 감정의 움직임이 있다. 김수영 시들을 읽을 때 깨달은 거지만, 나는 말들의 속도감을 좋아한다. 박정대의 시들이, 다시 보니 그렇다(소월시문학상 수상자인데, 그보다는 김수영문학상이 어울렸을 시인이다).
<단편들>을 다시 뒤적이다가 '사북에서'에서 눈길이 멎었다(확인해보니 시인이 강원도 정선 출신이다). 이런 속도감과 응시는 어떠한가.
아 벌써 어두워, 걸어가면서 고양이들은
소리지른다, 좁은 길을 벗어난 막사 같은 집들은
덜컹거리는 문을 닫고 서둘러 성냥불을
켜본다,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교회당의 종소리
유난히 하얗다. 골짜기 가득 쌀밥 같은 눈 내린다
아 벌써 어두워, 고양이들은 뛰어가면서
소리지른다, 여인네들은 가슴이 뛴다
저녁 밥상을 준비한다 창문을 후려치며
바람이 달아나고 있다
시의 1연이다. 2연에서는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사내들의 모습이 묘사된다. '사북'을 제목으로 단 시들을 몇 편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시가 유일하게 기억하게 될 시다. 내가 좋아하며 지지하는 시의 좋은 사례다. 말의 속도감과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묘사. 사북의 저녁 풍경을 이보다 잘 묘사할 수 있을까. 고양이처럼 여인네들처럼 독자도 가슴이 뛰게 하는 시.



기억에도 그렇고, 확인해보니 <단편들>이 첫 시집이었고 이후에 아홉 권 가량의 시집을 더 펴냈다. 대략 절반 이상은 구입해서 읽은 듯한데, 그래도 내게는 <단편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재출간이 반갑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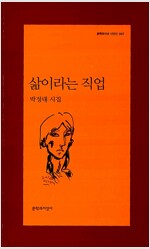



나대로의 판단이고 추정이지만, <단편들> 이후 (일단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나 <아무르 기타> 등) 박정대의 시에는 음악이 너무 노골적으로 시를 대신한다. 시인은 가객이자 음유시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음악과 적당한 거리와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시인은 점차 스스로를 뮤지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그런 시인들이 몇 명 된다. 아예 뮤지션인 경우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시 자체의 음악성이 실종된다. 시 대신에 그냥 음악이 들어와 앉는 것. 시는 메탈 사운드를 들려줄 때가 아니라 다만 읊조릴 때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담배를 피우며 음악을 들었다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연애는 다만 연애였을 뿐 상처를 주지도 상처를
입지도 않았다 연애는 그저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였을 뿐
내 가슴으로부터 한번 떠나간 애인은 영원히 복구되지
않았다 가끔 염소들이 울고 이 세상의 데시벨이 약간 올라가고
부서진 건물들이 다시 개축되고 몇 점의 구름이 흘러갔을 뿐
기침처럼 다만 흘러갔을 뿐
-'물질적 황홀8'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