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사회성 동물이다. 군말을 덧붙일 것도 없는데, 이 자명한 사실이 갖는 의미는 그러나 충분히 음미되고 있지 않다. 그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적절한 안내서가 없어서였다면, 마크 모펫의 <인간 무리, 왜 무리지어 사는가>(김영사)가 공백을 채워줄 만하다. 처음 소개되는 저자이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제자라고 하니까 왠지 친근하다(최재천 교수 역시 윌슨의 제자이니 동학이다). 개미와 같은 사회성 곤충 연구에서 인간의 행동진화에 대한 연구까지, 궤적도 윌슨과 비슷하다(책의 헌사에서도 윌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선 곤충과 포유동물, 수렵채집인 사회를 통해 어떻게 친족사회에서 더 큰 사회가 출현하는지, 국가는 어떻게 건설되고 붕괴되는지, 집단 간의 동맹과 충돌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끼리끼리 뭉치고 외부자를 배제하거나 포용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밝힌다."
인간의 무리성, 내지 사회성은 다르게는 '초사회성' '초유기체성'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책들도 나와 있다. 스승인 윌슨의 공저로 <초유기체>(사이언스북스), 국내서로 정연보 교수의 <초유기체 인간>(김영사)이 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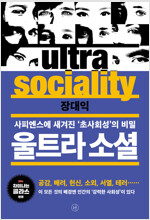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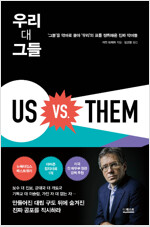
장대익 교수의 <울트라 소셜>(휴머니스트)도 마찬가지. 우리 대 그들이라는 무리짓기 본성은 사회학 책들에서도 분석거리다(부족주의 정체성에 관한 책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무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니까 '인구'라는 주제도 떠올리게 되는데, 인구학자 폴 몰랜드의 <인구의 힘>(미래의창)도 참고할 만하다('인구학' 분야는 프랑스가 앞서가는 모양이다). 그러고보니 언젠가 '인구'를 주제로 한 책들을 소개한 적도 있다. 대니 돌링의 <100억명>(알키)도 그때 읽은 것 같기도 하다. 그 정도면 '인구의 힘'이 아니라 '인구의 공포'라고 해야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