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의 '언어의 경계에서' 칼럼을 옮겨놓는다. 지난해에 속편 <증언들>이 나온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에 대해서 적었다. 34년만에 나온 속편이라는 이례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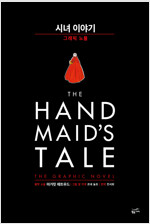
한겨레(20. 07. 17) <시녀이야기>, 34년 만에 속편이 나온 이유
어떤 소설의 후속작이 34년 만에 나오는 건 분명 드문 일일 것이다. 당대 화제작이었던 <돈키호테>(1605)의 속편이 10년 뒤에 나온 것도 늦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한 세대를 훌쩍 건너뛰어 나온 속편에는 특별한 사정을 있지 않을까. 어림에 그 사정은 작가 내부의 것이기보다는 외부 사정일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의 대표 작가로 평가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 이야기>(1985)와 그 속편 <증언들>(2019)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두 작품을 연결시켜주는 건 작가의 내적 동기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의 반복이고, 그 시대성에서 독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시대성인가. <시녀 이야기>가 출간된 1980년대 중반은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기로 전세계적으로 보수주의가 팽배하던 때였다. 당초 스탈린체제의 소련을 겨냥한 조지 오웰의 <1984>(1949)가 정작 1984년에는 새로운 억압과 감시체제로 화살의 방향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1960~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세대로 성장하고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한 애트우드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레이건 시대의 미국을 가상의 신정국가로 비유한 디스토피아 소설 <시녀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다(두말할 것도 없이 <증언들>이라는 늦은 속편의 배경에는 트럼프 시대의 등장이 있다).
애트우드는 소설에서 묘사되는 가부장적 전체주의 국가 길리어드가 미래의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 소설의 말미에 놓인 ‘<시녀 이야기>의 역사적 주해’에서(이 주해 역시 소설의 일부다) 22세기 말 한 역사학회 발표자의 주요 업적이 ‘이란과 길리어드: 일기를 통해 바라본 20세기 후반의 두 유일신정국에 대한 연구’라는 설정을 통해서 레이건 시대 보수화된 미국의 가까운 미래상이 이란과 같은 신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이 길리어드의 모델인 것은 아니다. 길리어드는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이 세우고자 했던 기독교 신정국가를 그대로 실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교리를 그대로 구현하고자 한 길리어드는 남성 권력자 사령관을 정점으로 모든 것이 위계화된 가부장제 사회다. 구성원들의 모든 활동이 철저하게 통제되며 여성은 가임과 출산으로만 역할이 한정된다. 그에 따라 여성은 아내와 시녀(대리모), 하녀, 아주머니 등으로 계층화, 위계화된다. 얼핏 <1984>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희망도 갖기 어려운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트우드는 적어도 오웰만큼 부정적이지는 않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오브프레드가 자유를 박탈당하기 이전의 이름과 가족에 대한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희망을 갖게 하는 설정이다. 게다가 오브프레드 같은 시녀들뿐 아니라 길리어드 체제의 내부자들조차도 규칙에 대한 위반을 거리낌없이 제안하거나 저지른다. 주인공 윈스턴의 반란 기도가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1984>의 결말과 비교되는 점이다.
다만 <시녀 이야기>의 희망은 그 ‘역사적 주해’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17세기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해 자행된 마녀사냥을 다시 소환하여 환기시키는 오브프레드의 기록을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식으로 ‘시녀 이야기’라고 이름붙이고 ‘이야기’(tale)에 여성을 비하하는 ‘꼬리’(tail)라는 뉘앙스를 얹어서 희희덕거리는 이들이 후대의 주해자들이다. 그들은 과거의 진실은 암흑에 갇혀 있기에 지금의 선명한 빛으로도 정확히 해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녀 이야기>의 독서 혹은 해독은 이러한 역사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가능하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여성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독자가 오브프레드의 증언의, 애트우드의 메시지의 정확한 수신자가 될 때에라야 이 반복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