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어제 지방강의를 다녀온 여파인지, 몸은 오늘을 주말로 생각하는 듯하다. 일요일 밤이지만 토요일 밤 같은 기분(내일은 계절도 바뀌는군). 당장 이번주 강의준비에도 바쁜 시간인데, 마음이 느긋하다. 내친 김에 페이퍼를 더 적는다. 화이트 앤 블랙, 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두 권을 책을 떠올렸기 때문이고 동시에 '접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서다.



먼저, 리처드 다이어의 책 <화이트>(현실문화). 표지는 까매서 특이한데(원서를 찾아보니 흰색이다) 부제가 책의 내용을 요약해준다. '백인 재현의 정치학'. 저자는 영화학자로 앞서 <스타>(한나래)란 책으로 알려진 바 있다(이미 사라진 책이 돼버렸는데, 그럴 만하다. 25년 전에 나왔으니). 영화학자답게 주로 다루는 건 영화를 중심으로 한 시각 매체에서의 백인 이미지다.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백인을 긍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우월한 백인'을 각인시켜주는 것(거꾸로 '블랙'과 '흑인'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비교해볼 수 있겠다.
"다이어는 이 책에서 주로 시각적 재현을 다루고 있는데, 중세 이래 서구 문화에서 시각은 특권적 감각이었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사진이 지식, 사상, 감정의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백인 얼굴을 표준으로 삼아 발전한 사진술, 할리우드 영화에서 스타를 비추는 조명 관습에서 드러나는 백인성, 기독교적인 레토릭에 부합하는 빛의 사용과 백인성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그러한 화이트(백인) 재현이 역설적으로 '가난한 백인'에 대한 주목을 가로막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수도 있겠다. <알려지지 않은 미국 400년 계급사>(살림) 같은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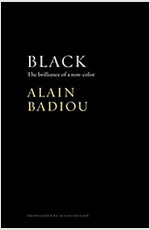

'화이트' 덕분에 생각난 책이 알랭 바디우의 <검은색>(민음사)이다. 공산주의 철학자가 '레드'를 다루는 건 자연스러운데, 블랙(아나키즘의 색이긴 하다) 예찬?
"진리와 혁명의 철학자인 바디우는 ‘검정(le noir)’이라는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쓴다. 군대에서의 춥고 어두운 밤에서 시작해 유년 시절의 깜깜한 방, 손가락에 묻은 잉크를 지나서 혁명기 프랑스의 검은 깃발과 붉은 피에 이르기까지. ‘무색의 섬광들’이라는 부제처럼, 검은색에 관한 찬란한 사유들이 펼쳐진다."
바디우의 책들은 주섬주섬 모아놓은 상태인데, 막상 읽을 짬이 없었다(지젝도 잔뜩 밀려 있는 형국이라). 그래도 '대작'들에 비하면 가벼운 책이어서 <검은색>은 노려봄 직하다.



블랙(흑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은 좀 나와 있다. 몇 권 골라봤는데, '화이트'와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겠다. 미국 사회의, 여전히 강고한 인종차별 문제가 낳은 이번 흑인 사망 시위는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새삼 질문하게 한다(낮에는 일본에 대해 던졌던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