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에 실은 '언어의 경계에서' 칼럼을 옮겨놓는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중기소설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1859)의 의의에 대해서 적었다. 최근 도스토예프스키 전작 읽기 강의에서 다룬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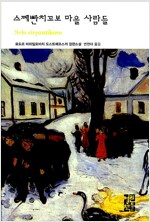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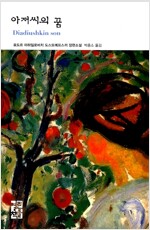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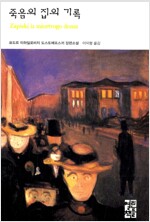
한겨레(20. 04. 24) 화해와 조화를 추구했던 도스토옙스키의 희극성
1849년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혹독한 유형생활과 군복무를 마치고 도스토옙스키가 수도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건 1859년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1846)로 문단의 격찬을 받으며 데뷔한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마흔을 앞둔 나이가 되었고 작가로서도 재기해야 했다. 유형생활을 소설화한 <죽음의 집의 기록>(1860)이 평단과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어낸 재기작이다.
그렇지만 시베리아에서 귀환하기 전에 도스토옙스키는 두 편의 소설을 <죽음의 집의 기록>보다 한해 먼저 발표했다. 작가 스스로 ‘희극 소설'이라고 부른 <아저씨의 꿈>과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이다. <죄와 벌>(1866)부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에 이르는 후기 걸작들에 견주어 ‘중기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은 말 그대로 중간단계로 간주된다. 러시아의 지방도시를 배경으로 한 두 편의 희극 소설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인데, 도스토옙스키 전집 읽기에 도전하는 독자가 아니라면 좀처럼 손에 들기 어려운 작품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건너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들을 포함하게 되면 도스토옙스키 창작의 전체 그림이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들>과 <분신> 같은 초기작에서부터 도스토옙스키는 앞선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전해진다). 이 영향은 한편으로 극복의 과제도 짊어지게 하는데, 19세기 중반 러시아 산문소설의 과제는 고골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바로 고골과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작품이 <스쩨빤치꼬보 마을 사람들>이다.
소설에는 퇴역 대령이자 지주인 예고르 로스타네프 집의 식객으로 포마 포미치라는 특이한 인물이 등장한다. 외모는 물론 말과 행동이 고골을 모델로 떠올리게 한다. 한갓 식객에 불과하지만 포마는 예고르와 그의 어머니 장군 부인을 완전히 사로잡고서 집안의 폭군으로 군림한다. 모스크바에서 소설 나부랭이를 좀 썼다는 포마는 문학적 첫걸음에서는 쓴맛을 보았지만 대신 기형적인 자만심을 갖게 된다. 장군 부인은 포마를 숭배하고 로스타네프는 그를 무조건 존중하고 환대한다. 그러는 사이에 포마는 농부들을 개선한다면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춤을 금지시키며 꿈까지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로스타네프에게 자신을 장군처럼 대우해서 ‘각하’라고 부를 것을 요구한다. 로스타네프는 포마의 무리한 요구에도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만 가정교사와의 밀회 장면을 포마가 목격하고 비난하자 분노가 폭발하여 그를 추방한다.
이런 결말이라면 추악함의 폭로자이자 교정자를 자임했던 고골에 대한 패러디로 읽을 만한 소설이다. 하지만 반전이 덧붙여진다. 마을을 떠나던 포마가 천둥번개에 놀라 쓰러졌다가 되돌아와서는 선의 화신으로 변모한다. 로스타네프의 결혼을 축복하고, 반목했던 모두와 화해한다. 도스토옙스키에게서 희극성은 추악함에 대한 조롱과 풍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조화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소설에서 화해와 조화는 ‘스쩨빤치꼬보 마을’에 한정된다. 포마-고골에서 포마-도스토옙스키로 거듭난 도스토옙스키는 이후에 ‘죽음의 집’으로서의 러시아와 이 ‘지하’ 세계를 천국(조화의 구현)으로 만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