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352호)에 실은 리뷰를 옮겨놓는다.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건강의 배신>(부키)을 서평강의에서 다루고 내친 김에 책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었다. 에런라이크의 다른 책들과 함께, 더불어 면역 관련서와 함께 읽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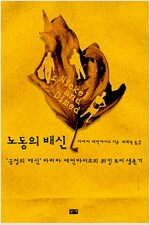

주간경향(19. 11. 18)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노동의 배신>, <희망의 배신> 등의 저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회비평가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이번에는 건강문제를 다뤘다. 원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건강의 배신>이라는 제목은 저자의 문제의식을 잘 응축하고 있다. 건강에 관한 통념뿐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다.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런라이크의 책들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가령 <노동의 배신>이 워킹 푸어로서의 직접적인 체험을 기록한 생존기이고, <희망의 배신>은 화이트칼라 구직과정의 실상을 기록한 체험기였다. <건강의 배신>도 출발점은 저자의 경력과 관계가 있다. 그 자신이 저널리스트로서 명성을 얻기 전에 생물학 전공자, 그것도 세포면역학 박사였다. 그렇지만 20세기 말에 이뤄진, 면역체계에 대한 생물학계의 새로운 발견은 저자와 같은 전공자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온다. 무슨 발견인가? 그것은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돕기도 한다는 발견이다. 비유컨대 면역체계는 “암세포에게 통행증을 부여할 뿐 아니라 검문소를 피하도록 알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면역체계가 알고 보면 내부 배신자 노릇도 한다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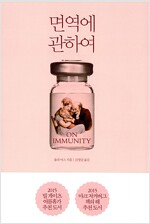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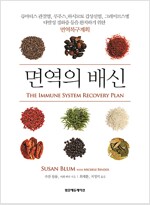
면역세포들의 이러한 ‘배신’ 행동은 기존의 과학 개념과 지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근대과학의 환원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세포는 더 작은 단위인 분자로 구성되고 분자는 예측 가능하다. 그런데 분자를 더 잘게 쪼갠 원자와 아원자 세계가 보여주듯이 본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어느 수준에서건 “미리 결정된 것도 아니고 무작위적인 것도 아닌 방식으로 일을 하는 능력”으로서 ‘작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17세기 과학혁명 이래로 결정론적 과학은 이 작인을 설명모델에서 제거하려 했지만 면역학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할 경우 면역세포의 행동은 이해불가능한 불가사의가 된다.
세포들이 작인의 지위를 갖는다면 우리 몸은 잘 조직된 유기체가 아니다. 유기체 모델에서는 각 부분이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우리 몸의 구성원들은 전체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다. 중앙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세포 수준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며 이는 전체의 이익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면역세포가 우리 몸의 다른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의 유기체라기보다는 ‘연맹체’에 가깝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곧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영세산업이었던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은 연간 3조 달러의 산업으로 성장했고, ‘마음챙김’ 열풍이 불면서 질병은 개인의 불성실과 도덕적 결함으로까지 치부된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런 사회현상에는 자기 몸과 마음을 각자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저자는 묻는다. “몸속에 있는 약간의 불량세포만으로도 목숨을 잃는 마당에 식단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사불멸에 대한 헛된 갈망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자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1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