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330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최근에 강의에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시 다룬 김에, 마침 발표 70주년이 된 작품이기도 해서 작품의 주제를 다시 생각해본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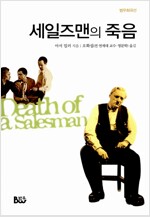

주간경향(19. 06. 10)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 혹은 '아버지의 죽음'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1949)을 읽기 위하여 특별한 명분이 필요하지는 않다. 사뮈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1953)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가장 유명한 극작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도 매년 공연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현재적이다. 발표 70주년을 맞으면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시 읽으며 그 현재성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알려진 대로 <세일즈맨의 죽음>은 늙은 세일즈맨 월리 로먼의 애환과 죽음을 다룬 작품이다. 윌리는 아내와 두 아들을 식구로 거느린 가장이다. 과거에 전성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예순을 넘긴 현재는 30년을 넘긴 영업직 생활에 지쳤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 허탕을 치는 날도 잦다. 윌리가 귀가하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까지 만 하루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지만 작가는 윌리의 회상과 환상 장면들이 무대에 동시에 제시될 수 있도록 했다.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으로 불리는 모더니즘의 기법이 희곡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아닐까. 덕분에 관객은 세일즈맨 윌리의 하루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압축적으로 보게 된다.
윌리의 회상과 환상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그의 형 벤이다. 윌리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벤은 알래스카로 떠난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다가 엉뚱하게도 아프리카로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인물이다. “나는 열일곱의 나이에 정글 속으로 걸어들어가 스물한 살에 걸어나왔지. 부자가 되어서 말이야”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벤은 조카들에게 처세훈도 남긴다.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공정하게 싸우지 마라, 얘야. 그래서는 절대 정글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부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든 허세이든 벤은 윌리의 모델이 되며 윌리는 그를 닮고자 한다. 그렇지만 정글처럼 비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 인정에 호소하려는 윌리의 모습은 그가 세일즈맨으로서 왜 낙오하게 되었는가를 시사한다. 아들에게 남겨줄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에 오르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가 의지하는 것은 환각을 통해 불러낸 벤이다. 벤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면 윌리가 마지막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이다. 때문에 한 세일즈맨의 죽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으로도 읽힌다. 한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꿈을 평생 추구한 인물이 윌리 로먼이라고 해도 좋겠다.
윌리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마무리되는 작품에서 그렇지만 희망의 단초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희망은 장남 비프가 보여주는 것인데, 작품에서 다른 식구들과 달리 유일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이 비프다.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헛되게 부유하며 젊은 시절을 낭비한 비프는 “네 인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라고 독려하는 아버지 윌리에게 맞서며 “아버지! 전 1달러짜리 싸구려 인생이고 아버지도 그래요!”라고 폭로한다. 그런 비프가 흐느끼는 것을 보고서도 감동하여 “저 애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 게 아버지 월리의 부정이다. 구제불능이라고 할 만한데, <세일즈맨의 죽음>의 또 다른 주제는 그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19.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