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328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지난주에 이언 매큐언의 <넛셸>(문학동네)에 대해 강의하기 전에 간단히 작성한 리뷰다. 소설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지만 스포일러에 해당하기에 리뷰에서는 <햄릿>의 패러디만 주로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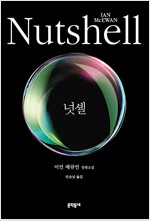


주간경향(17. 05. 27) 태어나느냐 마느냐, 햄릿적인 태아의 고민
영국 작가가 셰익스피어에 대한 오마주 작품을 쓰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대표작 <햄릿>을 다시 쓴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언 매큐언의 <넛셸>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므로 특이하지도, 놀랄 것도 없는 소설이지만 그것은 첫 페이지를 펼치기 전까지만이다. “나는 여기, 한 여자의 몸속에 거꾸로 들어 있다”고 말하는 화자가 태아여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자궁 속 태아가 화자로 등장하는 소설이 없지는 않다고 한다. 다만 햄릿을 태아로 설정한 전례는 없었다.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햄릿이 <넛셸>에서는 태어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태아로 바뀌었다.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자궁 속에 있으니 ‘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태명도 없고 특별한 태교도 받지 않는다. 그의 탄생에 관한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젊은 어머니 트루디가 아이보다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다. 이미 의식을 갖고 있는 ‘나’는 자궁 속에서 전해듣는 정보만으로 사태를 파악하는데, 트루디는 남편 존의 동생 클로드와 불륜에 빠졌다. 존은 가난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이고, 클로드는 옷과 자동차밖에 모르는 부동산 개발업자다. 형제라고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다. 그것은 마치 “내가 베르길리우스나 몽테뉴를 닮지 않은 것”과 같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부왕 햄릿을 닮지 않은 것은 마치 자신이 헤라클레스를 닮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 형제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넛셸>은 <햄릿>을 패러디하고 있지만, 트루디와 클로드가 공모하여 존을 독살한다는 전개는 <맥베스>를 비튼 것이다. 태아인 ‘나’는 두 사람의 음모를 저지하고자 하지만 자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두 사람의 음모가 성공한다면 ‘나’는 그들 관계의 걸림돌로 버려질지도 모른다. 반대로 만약 실패한다면 ‘나’는 어머니와 감방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해 탯줄을 목에 감고 자살할 궁리까지 한다. 하지만 자살은 숙부에 대한 결정적인 복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책 <나의 21세기 역사>를 끝까지 읽고 싶어한다. 자살 대신에 삶을 선택하는 이유다.
<햄릿>에서 아들 햄릿은 부왕의 유령을 통해서 숙부의 암살행위를 알게 되지만 <넛셸>의 ‘나’는 이미 어머니와 숙부의 음모와 그 결과를 알기에 부왕의 유령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유령이 등장해 두 악인을 응징할 수도 없다. 과연 어머니와 숙부의 범죄는 아무런 응징을 받지 않는 완전범죄가 될 것인가. 사건의 해결은 조사차 이들을 찾아온 경찰의 몫이 된다. 그리하여 셰익스피어 비극을 따라가던 <넛셸>의 결말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에 바통을 넘겨준다.
햄릿적인 태아를 화자로 설정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넛셸>은 아무래도 태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언 매큐언의 이야기다. 작가 매큐언의 존재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성 정체성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슈에 대해서 박학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리 허구적 설정이라 하더라도 공감을 떨어뜨린다. 매큐언의 햄릿도 너무 생각이 많다.
19.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