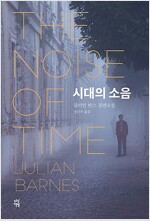현대 영국문학 강의에서 요즘은 계속 줄리언 반스를 다루는데 오늘 읽은 건 2016년작 <시대의 소음>(다산책방)이다. 정확한 집필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주제상으로는 맨부커상 수상작인 전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2011)와 이어지는 것으로 읽었다. 둘다 시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데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내면을 다룬 전기소설로 이오시프 만델슈탐의 시집에서 제목을 따온 <시대의 소음>에도 시간/시대(time)는 핵심 화두다. 다만 전작과는 전혀 다르게 시간/시대에 맞서서 책임적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다른 선택지를 탐색한다.
쇼스타코비치가 보여주는 건 그런 책임으로부터의 후퇴이고 주체성의 포기다(그는 스탈린 사후 최고 권력자가 된 흐루쇼프에 견주면 자신은 ‘벌레‘라고 말한다). 그는 작곡가로서 자존심은 유지하지만 부당한 권력의 간섭이나 탄압에 항거하지 않는다. 그에게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굴종적 주체다. 이 굴종적 주체라는 표현도 아이러니인데 내면과 외양 사이의 간극과 불일치를 표시하는 아이러니가 쇼스타코비치의 처세술이자 생존법이다. 그는 그를 통해서 ‘겁쟁이‘로서 스탈린시대의 숙청을 피해가며 노년까지 목숨을 부지한다. 반스가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에서 잘 보여주는 건 그런 겁쟁이의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내면이다(이 소설은 아이러니에 대한 탐구로서 훌륭하다).
반스가 참고한 책들 가운데 엘리자베스 윌슨이 쓴 쇼스타코비치의 평전은 강의가 끝나고 주문했다. 매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 보상으로 책을 구입하는데 주로 이런 류의 평전이거나 관련서다. 스탈린 시대 예술가 탄압을 다룬 책이라면 <시대의 소음>이 다른 책들에 비해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가령 나데쥬다 만델슈탐의 <회상> 같은 책과 비교해보라). 대신 반스의 주안점은 다른 데 있고 나는 그것이 아이러니와 함께 예술(음악)의 존재 목적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음악 자체로 존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