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고슬라비아 시인 바스코 포파의 시집 <절름발이 늑대에게 경의를>(문학동네, 2006)을 구입했는데, 정현종 시인의 '추천의 글'이 맨앞에 적혀 있었다. 시인이 경험도 나와 다르지 않아서 '작은 상자'란 시를 통해 바스코 포파를 처음 만난 인연을 고백하고 있었다. 한데, 다른 시들은 대략난감이었던 듯, 이렇게 적어놓았다.
이번에 번역되어 나오는 이 선집이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니 대체로 해독이 쉽지 않은데, 그 점은 영역자인 찰스 시믹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써, 그는 그 까닭을 포파의 시가 갖고 있는 세르비아적 전통 - 역사, 민속, 신화 등 - 이라는 배경과 시인의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에서 찾고 있다.
인용문에서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써'는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닌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린 게 어제의 일이다. 암튼 정현종 시인과 궁합이 더 잘 맞는 시인은 아무래도 스페인어권 시인들이고 그 중에서 파블로 네루다를 빼놓을 수 없겠다('정현종과 네루다'란 글을 기획한 적이 있었다). 네루다의 시편들을 여럿 우리말로 옮긴 바 있는 시인이 이번에 더 보태서 두 권의 네루다 시집을 새로/다시 출간했다. 관련기사를 옮겨놓는다.
사실 청년 네루다의 대표작인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는 나대로 자세히 읽기를 시도해본 적도 있다(http://www.aladin.co.kr/blog/mylibrary/wmypaper.aspx?CNO=0&PCID=492&CType=1&paperid=793966). 찾아보니 작년초의 일이다. 그때 참조했던 정현종 시인의 번역은 완역이 아니어서 다소 아쉬웠는데, 이번에 완역본 시집이 나왔다니 반갑다. 유고에서 아르헨티나로의 시적 여정을 이 겨울의 마지막 '여행'으로 삼아봐야겠다...

경향신문(07. 02. 08) 정현종시인 네루다 첫시집 ‘스무 편의…’ 완역
시인 정현종씨(67·전 연세대 교수)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1904~1973)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정시인은 1989년 번역했던 네루다 시선집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민음사)를 통해 네루다의 존재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그후 네루다는 노시인이 우체부에게 시를 가르치는 내용의 영화 ‘일 포스티노’ 등을 통해 더욱 유명해졌고, 그의 시선집도 94년 개정판이 나오는 등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전의 시선집 번역을 가다듬어 ‘네루다 시선’(민음사)으로 제목을 바꾸고, 네루다의 첫 시집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는 21편을 모두 번역해 원래의 제목을 되돌려줬다. 국내에서 시선집 제목이었던 ‘스무 편의…’가 시집 제목으로 바뀐 것이다.
“개인적으로 네루다, 로르카(스페인), 릴케(독일)를 20세기의 위대한 시인으로 생각하며 그중 최고는 네루다라고 본다”는 정시인은 네루다 시집 ‘백 편의 사랑 소네트’(문학동네)를 이미 번역했으며 ‘충만한 힘’이란 만년의 시집도 새로 번역할 계획이다. 그는 네루다 탄생 100주년이던 2004년 칠레 정부가 전 세계의 문화인 100인에게 수여한 네루다메달을 받기도 했다.
“네루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시가 언어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생동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의 시를 통해 드러날 때 사물은 희희낙락하는 것 같고, 스스로의 풍부함에 놀라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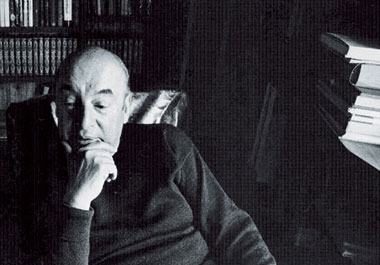
태국·중국·일본 등 극동 주재 영사를 지냈던 네루다는 광산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원의원에 출마, 정치를 시작했고 아옌데 민주정권을 지지했던 현실참여 시인이었다. 초기 낭만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시는 후기로 가면서 역사가 들어있는 혁명시로 바뀐다. 그래서 민중 시인 김남주씨는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됐을 때 네루다의 시를 틈틈이 번역해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1988)라는 번역시집으로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정 시인 정현종이 보는 네루다의 미덕은 남미의 풍성하고도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태어난 초현실주의적 상상력, 만물과 하나가 되는 힘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책으로는 처음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된 시집 ‘스무 편의…’는 열아홉살의 시인이 지닌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랑시들로, 젊은날 사랑의 소용돌이를 열광적 호흡으로 노래한다.
‘한 여자의 육체, 흰 언덕들, 흰 넓적다리,/네가 내맡길 때, 너는 세계와 같다./내 거칠고 농부 같은 몸은 너를 파 들어가고/땅 밑에서 아들 하나 뛰어오르게 한다.//나는 터널처럼 외로웠다. 새들은 나한테서 날아갔고,/밤은 그 강력한 침입으로 나를 엄습했다./살아남으려고 나는 너를 무기처럼 벼리고/내 화살의 활처럼, 내 투석기의 돌처럼 벼렸다.’(‘한 여자의 육체’ 일부)
정시인은 “‘터널처럼 외로웠다’는 말이 얼마나 신선하고도 놀라운 표현인가”라고 물으면서 “성욕의 충동에 따른 즐거움과 괴로움,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라는 형식을 통해 질서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스무 편의 사랑시의 시로 끝났으면 밋밋하고 싱거웠을 텐데 한 편의 절망의 노래를 덧붙인 게 묘미”라며 “사랑의 상실 없이,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라고 말했다.(한윤정기자)
07.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