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1274호)에 실은 북리뷰를 옮겨놓는다. 존 허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위즈덤하우스)에서 한 가지 테마와 관련한 내용을 적었다. '가장 짧은 세계사'라고는 하지만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긴한 책이다. 리뷰에서 다룬 건 그 일부다. 리뷰에서 언급된 페트리샤 크론(패트리샤 크로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시공사)의 공저자인데, 존 허스트가 참고한 책은 크론의 <산업화 이전 사회들>로서 현재 배송을 기다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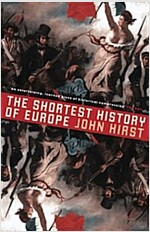

주간경향(18년 5월 01일) 유럽이 중국을 앞설 수 있었던 이유
공항서점 베스트셀러는 독서 트렌드를 읽게 하는 한 척도다. 어떤 책이 읽히는가가 궁금해서 손에 든 책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인데, 지난해 가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서점에 발견하고 곧바로 구입했었다. 짐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유럽사 책이 아닐까 싶다. 책의 원제는 '가장 짧은 유럽사'다. 유럽사의 상식과 표준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다.
표준이라고 하지만 저자의 독창적인 관점이 없는 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인 저자는 유럽사를 균등하게 다루지 않는데 적은 분량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부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서다.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을 따지자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독일의 종교개혁, 잉글랜드의 의회정치, 프랑스의 혁명적 민주주의가 폴란드의 분할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게 저자의 입장이다.
이는 자연스레 역사서술에서 선택과 집중과 함께 독특한 구성을 낳는다. 유럽사 전반에 대한 짧은 개요를 제시한 다음 주제별로 꼼꼼하게 다시 되짚어보는 식이다. 이러한 반복적 구성 덕분에, 책을 덮으면 유럽사를 두 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럽의 기이함'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책의 미덕이다.
저자가 토로하는 바에 따르면 그의 유럽사 이해는 이슬람사 연구자인 페트리샤 크론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사 연구자가 아니어서 크론은 유럽사의 특이성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정치경제체제가 유럽식 모델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이 특이성이 간과된다. 많이 지적되는 것이지만 16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문명은 유럽보다 앞서 있었다. 유럽은 인쇄술과 제지술, 나침반과 화약 등을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수입했다. 그렇지만 대의정부가 수립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었다. 곧 유럽은 근대를 발명한다.
어떤 차이 때문인가? 권력의 분산과 문화의 개방성이 핵심이다. "유럽에서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으며, 고급문화는 여러 요소의 혼합물이었고 세속적 지배에 견고하게 묶여 있지 않았다." 가령 중세 유럽에서 황제와 교황 사이의 충돌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오랜 긴장을 낳았고 권력 분산의 선례가 되었다. 강력한 군주제 국가의 출현이 지연되면서 독립적인 도시국가와 제후국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규모 국가들 덕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능했다. 더불어 유럽 전체의 변형이 가능했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권력이 황제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개개인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자백가 시대가 중국사상사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도 동일하다. 강력한 통일국가와 전제권력 하에서는 새로운 사상과 혁신이 탄생하기 어렵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 과연 과거의 교훈에만 그칠 것인가. 1인권력체제가 공고해져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모습이 역사의 교훈을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8.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