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를 사랑한다는 건
알랭 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 은행나무 / 201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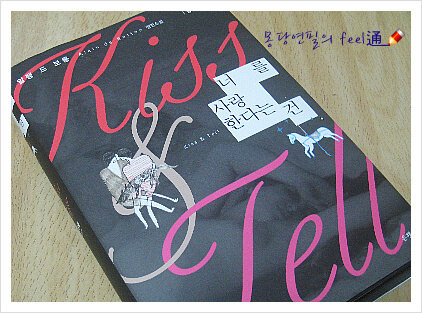
세상에, 아직도 보통을 모른단 말이야? 책을 좋아하고 좀 읽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곧잘 물어본다. 그거 읽어 봤어?로 시작해서 어때? 재밌던가?로 이어지는 질문들. 어쩌다 내가 읽어보지 못한 책이나 작가가 거론되면, 거기다 해당 책(작가)을 자신이 읽었다면 그들은 의외라는 듯 말한다. 세상에, 아직도 그걸 안 읽어봤단 말이야?라고.
내겐 알랭 드 보통이 그런 존재였다. 누군가 내게 알랭 드 보통의 작품이 뭐가 있지? 혹은 니가 갖고 있는 보통의 책은 뭐야?라고 묻는다면 줄줄 읊어댈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작품을 아직 하나도 읽지 못했으니...참,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내가 드디어 보통을 만난 것이다.
<너를 사랑한다는 건>이 바로 나와 보통의 첫만남 책이다. 이 책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일까>에 이은 보통의 3부작 완결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3부작부터 거꾸로 읽어가면 되잖아?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아니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바로 책의 이야기가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다. 제목이나 이야기의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 책이 ‘사랑’을 다루고 있음이 분명한데, 철학이나 인문서적도 아닌데 왜 이다지도 어려운 것이냐! 하늘을 보며 외치고 싶었다.
책은 나(화자)가 6개월을 함께 지낸 여자친구에게서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실 말이 편지지 “너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로 시작한 그건 바로 이별통보였다. 여자친구는 가차없이 비난을 쏟아낸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르시시스트인 그가 사랑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 뿐이었다고. 언제나 고압적이고 독선적인 그로 인해 정말 힘들었다...등등. 갑자기 여자친구에게서 실연당한 그는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전기’라는 단어에 눈길이 머물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을 다룬 책을 보면서 그는 ‘공감하다’는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되고 곧이어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를, 전기를 써보자고 마음먹게 된다.
그가 주목한 인물은 얼마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이사벨 로저스였다. 흔히 전기(傳記)는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인물, 위인이나 유명인의 업적과 삶을 적은 기록이라 지극히 평범한 이사벨은 적합한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겐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예전 여자친구가 일침을 쏘아붙였던 것들, 자신의 무심함과 독선적인 성향 같은 결점으로 인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관찰하기 시작한다. 이사벨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그녀의 가족관계, 성격, 습관, 남자친구 등등 지극히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알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이사벨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책을 읽는 내내 떠오른 생각, 사랑이 이다지도 복잡했던가? 이렇게 난해한 거였어? 남편과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인이 되어 결혼에 이르기까지를 곰곰 되짚어봐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내게 단점이 있듯 남편에게도 분명 단점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을거라(지금은 모르겠지만...) 여겼기에 서로의 반려자가 되었다. 거기에 비해 책 속의 연인들은 너무나 완벽한 것을 추구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 사실 어느 한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기대했던 보통과의 첫 만남은 그저 그런 수준으로 맺고 말았다. 거기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이 <키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말들>의 개정판이란 걸 뒤늦게야 알게 됐다는 점이다. 집안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모를 뿐 분명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책이라니. 이.럴.수.가. 순간 현기증이 났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순 없다. 보통과의 만남을 이렇게 접을 수 없다. 다행히 지인들과의 독서모임에서 몇 달 후 보통의 책을 읽기로 했다. 그때를 다시 기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