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페스의 집
수전나 클라크 지음, 서동춘 옮김 / 북노마드 / 2009년 12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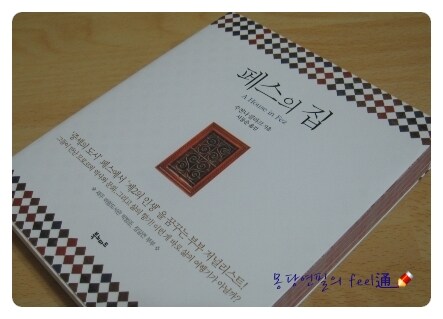
저만 그런가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유명배우의 이름이 헛갈리는가하면 외출할 때마다 열쇠며 지갑, 휴대폰을 찾아 온 집안을 찾아 헤맵니다. 얼마전에도 그랬답니다. ‘모로코’란 나라이름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뭔지 아세요? 그레이스 켈리였어요. 아름다운 배우에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된 환상적이고 꿈같은 일화가 생각나서 <페스의 집>을 만날 때 은근히 기대를 했답니다. 모로코의 이야기가 담겼으니 당연히 그 얘기도 수록됐으려니...했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모‘나’코와 모‘로’코를 그만 착각했지 뭐예요? 글자는 한 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나는 유럽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속해있는 나라인데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답니다. 허나, 마냥 의기소침해 있을 순 없지요. 이번 참에 정식으로 모로코와 만나면 되니까요. 그죠?
모로코. 아프리카의 북서단에 위치한 이 나라는 제가 무지해서 그렇지 많이 알려진 나라더군요. 그 유명한 잉그리드 버그만과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영화 <카사블랑카>가 바로 모로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 하네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중세의 도시’ 페스에서 ‘제 2의 인생’을 꿈꾸는 부부 저널리스트란 표지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호주의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일하는 수전나 클라크와 샌디 매커천이 모로코의 페스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수전나와 샌디에게 모로코의 첫 번째 여행은 배탈과 바가지로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 부부는 여느 나라보다 깊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은 것이 바로 페스였습니다. 모로코의 문화와 정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벽도시 페스.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질듯한 좁은 골목길과 하루 5번 첨탑에 올라 기도시간을 알리는 무에진의 구성진 가락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는 곳, 페스.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온 수전나와 샌디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국적인 풍취로 가득한 페스를 잊지 못합니다. 첫 눈에 반한 연인을 그리워하듯 수전나는 하루에도 수시로 페스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 ‘모로코에 집을 한 채 사면 어떨까?’ 샌디는 아내의 이런 터무니없는 의견에 “페스에서 한번 찾아보지 그래?”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호주에서 비행기로 하루종일 날아가야 도착하는 곳, 프랑스어 몇 마디 외엔 제대로 된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지만 그들의 페스행을 막진 못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처럼 끝도 없었다. 하지만 모로코, 그 중에서도 페스에 집을 구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리고 우리는 사고를 쳤다. - 13쪽.
이후 책은 그들이 페스에 집을 마련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어렵사리 발견한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리아드 자니’란 이름을 붙입니다. 작은 정원과 분수대를 갖춘 ‘리아드’식의 집은 바닥에 색색의 타일로 퍼즐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모자이크로 정교하게 만든 ‘젤리즈’를 비롯해 전체적인 원형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슬림 달력으로 1292, 서양달력으론 1875년 이후로 보수하지 않은 집이어서 여기저기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천장은 구멍이 뚫리기 일보직전이었고 하수구 시설은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아랍식 전통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시키면서 수도며 배관, 전기 시설처럼 생활에도 편리하도록 복원, 수리를 거치는 과정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인부들은 어찌나 느릿느릿한지, 걸핏하면 꾀부리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저자는 적당히 응대하고 부추기면서 ‘리아드 자니’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해내고 말지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책을 읽다보면 곳곳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낯선 땅에서 두 번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하지만 막상 꿈을 실현할 단계에 이르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맞닥트리면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마는데요. 수전나와 샌디는 집을 복원하는 것에만 치우지지 않습니다. 페스에서 살아가는 위해 그들은 모로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일상을, 결혼이나 할례, 라마단 같은 의식이 치러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신과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을, 오래도록 이어져온 전통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페스의 건물들을 사랑한다.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나무 한 토막, 벽돌 하나하나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손으로 무늬가 새겨지고 세공되는 곳, 인간의 손길로 집을 짓는 그 땅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 387쪽.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13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모로코.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14세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곳, 페스. 이 책을 통해 처음 만났지만 그곳의 신비로움이 왠지 제게도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만 책에는 모로코와 페스, 저자의 집을 복원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중간중간 수록해놓고 있는데요. 몇 군데에 모아둔 사진을 본문의 내용과 관계된 대목에 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