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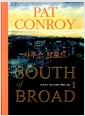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해질 무렵. 대저택의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 그 뒤로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을 보고 있으니 왠지 오랫동안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속에 존재하는 느낌이다. 팻 콘로이. 지금까지 어떤 작품으로도 접하지 못한 작가지만 이 책의 표지에서부터 매료된 내게 그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우스케롤라이나의 찰스턴. 남북전쟁이 시작된 도시로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남부인의 자존심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보다 절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 찰스턴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레오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오랫동안 이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을 힘겹게 배웠다.’고 말문을 연 레오는 1969년 6월 16일, 서로 관련이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든 일이 시작됐음을 털어놓는다. 못 생기고 소극적인 자신에 비해 눈부실만큼 아름답고 카리스마 넘치는 형 스티브가 갑자기 자살을 하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레오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그 후엔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그 일환으로 신문배달과 이웃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레오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1969년 6월 16일, 레오에게 어머니의 지시로 몇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산골 마을의 고아원 출신인 나일즈와 스탈라 남매를 만나 그들을 수갑에서 풀어주는 지혜를 발휘하고 길 건너편 집으로 이사 온 쌍둥이 남매, 시바와 트레버를 만나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며 이름난 가문의 후계자이자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채드워스와 프레이저 남매와 몰리를 만났으며 흑인 코치의 아들인 아이크를 만난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에 수녀였다는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그리 특별한 것 없는 만남이었지만 레오는 1969년 블룸스데이에 만났던 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들과 함께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해간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1989년 어느 날. 자신이 소망하던대로 저널리스트가 되어 칼럼쓰기에 여념없는 레오에게 어느날 미모의 여인이 찾아온다. 레오에게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을 기억을 안겨준 시바가 유명한 배우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혼란과 방황의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된 그들은 서로에게 반려자가 되어 살아가지만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건 아니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서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시바의 방문을 계기로 그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어린 시절과 그동안의 일들로 얘기를 나누다가 시바에게서 트레버가 에이즈에 걸렸으며 행방이 모연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곧이어 그들은 트레버 찾는 일에 나서는데 그 과정에서 시바와 트레버 남매의 숨겨진 과거와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는데...
초반 다소 지루하게 진행되는 이야기는 레오를 비롯한 친구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의 관계가 다시 얽히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자신의 우상이었던 형의 죽음 앞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놓았던 레오는 이후 시바의 죽음도 보게 된다. 그리고 아내인 스탈라의 죽음까지도. 거기에 형 스티브의 자살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레오는 또한번 충격에 빠지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다. 1969년 여름 블룸스데이에 일어난 일을 글로 쓰면서 깨닫는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살과 살인, 마약, 강간, 동성애,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들이 모두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것 역시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지구의 공전과 단단히 고정되어 깨뜨릴 수 없는 통로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의 궤도를 총괄하는 법칙들 속에서 내 운명이 모습을 드러내가 시작했고, 나는 내 아치형 인생의 춤에 주역들이 되어줄 주인공들을 만났다.- 2권.452쪽.
운명이란 장난감 총을 쏘듯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바로 그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날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다. - 2권 461~462쪽.
1,2권 두 권을 합해 자그마치 천 페이지 가까이 되는 소설 <사우스 브로드>. 1969년과 1989년을 오가며 레오와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문득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강을 떠올렸다. 찰스턴을 싸고 흐르는 강이 어떤 일에도 흐름을 멈추지 않듯 우리의 인생 역시 오로지 앞으로 흘러갈 뿐이란 것. 간혹 걸림돌을 만나더라도 결코 흐름을 멈추지 않는 강, 그것이 바로 인생이란 걸 팻 콘로이는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저자의 수려한 문장 때문이었을까. 레오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책장을 덮었지만 아직도 그의 주변에서 맴도는 내 마음이 느껴진다.
‘이토록 훌륭하게, 이토록 아름답게 쓰는 작가도 없다’는 띠지의 문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작품이지만 다소 치명적인 옥의 티가 있었다.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양장본에 가름끈이 없다니. 독자를 배려하지 않은 듯해서 그만큼 아쉬움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