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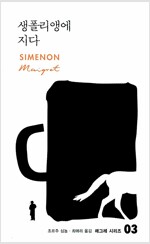
요즘 조르주 심농,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그레반장에게 꽂혀 있다. 다른 읽을 책들도 많아서 시작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결국 1권을 손에 들고 나서는 계속 연속으로 2권 3권 읽어내려가고 있다. 조르주 심농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작가여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글들은 어떨까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낸 형사 메그레반장은...이제까지 내가 좋아라 한 탐정들, 콜린 덱스터의 모스경감과 체스터튼의 브라운 신부, 존 르 카레의 조지 스마일리(탐정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첸들러의 필립 말로 등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사람. 거구에 트렌치 코트를 입고 파이프담배를 늘상 입에 물고 사는, 그리고 시원한 맥주를 즐겨 먹는 남자.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직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잃지 않는 인간미 넘치는 남자..으으으.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다. 그저 메그레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독서는....은근한 행복이다.
<수상한 라트비아인>도 그랬지만 <갈레씨, 홀로 죽다>는 마음 한켠 참 쓸쓸해지는 소설이었다. 제목을 보고 대충 내용을 짐작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한 사람의 가여운 일생이, 무엇하나 손에 제대로 쥐어보지도 못했던 그 일생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보는 내내 마음이 짠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다리던 모습. 그것은 상상만 해도 처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생이 힘들었고 부인에게나 자식에게나 친척들에게 능멸받은 소시민으로서의 에밀 갈레. 그의 일생은 정말 뭐였을까..그리고 <수상한 라트비아인>이나 <갈레씨, 홀로 죽다>에서의 메그레반장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그들을 대하는 마음, 고독함을 함께 느끼는 그 깊은 속내에 함께 빠져들고 말았다.
지금 나온 6권 전부 가지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이번 주 내에 다 보지 않을까 싶다..무섭다..ㅜ 70권이 완간되기를 빠른 시일 내에 완간되기를 바라면서도 시간조절 못하고 읽어대는 내가 무서워서 말이다. 존 르카레나 콜린 덱스터의 소설들은 이제 신간이 잘 나오지 않으니 아쉬울 뿐이고. 체스터튼과 첸들러의 책들은 다 나와버렸으니 시시하고. 이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르주 심농의 메그레반장 시리즈. 게다가 가볍고 종이질도 좋고 표지 디자인도 맘에 들어서 들고 다니기 좋은 책들이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지금 <생폴리엥에 지다>를 읽고 있는데, 이 역시 내 마음을 울릴 조짐을 첫장부터 보이고 있다. 탐정이나 스파이가 등장해도 그것이 유독 범죄소설이나 추리소설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소설'로 심지어는 '명작소설'로 다가오는 것은 작가가 인간에 대한 깊은 혜안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지. 특히, 사람의 본성, 저 밑바닥에 깔린 감정들, 미묘한 느낌, 어떨 때 드러나는 사악함, 욕심, 그리고 이어지는 씁쓸함 등이 마치 나의 옆에서 일어난 양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야단스럽지 않게 묘사되는 글들을 만나는 건...진정한 행운이다. 따라서 조르주 심농의 책들을 만난 나는, 아무리 힘들다 힘들다 투덜거리기 바빠도 행운아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