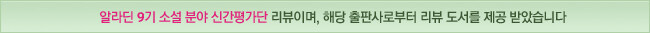[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 여백(여백미디어)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어느날 눈을 떴는데, 모든 게 수상하고 낯설다.
어딘가 낯익은 상황이다. 어느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진짜 아내를 찾아나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리브카 갈첸의 [대기 불안정과 그 밖의 슬픈 기상 현상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길러온 본인의 콧수염이 '원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겪는 엠마뉘엘 카레르의 [콧수염]에서도 주인공이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K 역시 어느 토요일, 예기치 않게 눈을 떠 모든 것이 전과 달라진 상황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아내와 딸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만화 속 요괴인간들처럼 보였다." p.73
"그러나 뭐가 감사한 것인지, 뭐를 축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가면무도회에 던져진 느낌이어서 K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p.74
"K는 자신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잘 팔리지도 않으면서 매대에 진열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같다고 생각하였다. 가족이라는 슈퍼마켓에 아내는 아내라는 이름의 상표로, 장인은 신부의 아버지라는 라벨로, 처제는 신부의 역할을 맡은 신상품의 견본으로 이렇게 함께 서 있는 것이다." p.86
그의 눈에 "아내와 딸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만화 속 요괴인간들처럼 보였"고 그런 요괴들이 함께 모여 손님을 맞고 식을 올리는 처제의 결혼식장에서는 "가면무도회에 던져진 느낌이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스스로가 "매대에 진열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같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전날 밤 기억이 끊긴 1시간 30분 동안의 알 수 없는 시간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K는 그 비어버린 1시간 30분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 자신을 감시하는 수상한 존재들을 만나고 끝없이 이상한 경험만 한다.
어떤 계기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찾아나선 사람은 결국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뿌리라고 믿는 어린 시절, 그 시절의 가족, 특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다. K 역시, 정신과 의사인 친구 H의 조언으로 가족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나가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두가 의심스럽고 모든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떠올리자 역시 순간적으로나마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
"생전의 모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단어를 부르자 K의 눈꺼풀 뒤에 있는 눈물샘과 그 주위에 산재한 누선으로부터 결막낭 안으로 투명한 액체가 고여 들었다. 내안각의 눈물주머니 속에 모여 있던 약알칼리성의 눈물이 눈동자를 적시는 것을 K는 느꼈다. 그러나 그 양이 미미해, 액체는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촉촉하게 눈동자를 적시다가 서서히 말라갔다." p.116
그럼에도 죽은 어머니를 제외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실제의 아내는 어디 있는가. 실제의 자명종은 어디 있으며, 실제의 딸, 실제의 강아지는 어디 있는가." p.122
K는 매일매일 함께 하던 너무나 익숙한 존재인 아내, 자명종, 딸, 강아지는 다 가짜라고 의심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몇십년 만에 만난, 그것도 겉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누나는 진짜라고 느낀다. 뭔가 부조리하지 않은가. 그래서인가, 불안과 의심과 수성쩍음으로 가득찬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 가장, 아니 근래 읽은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한 부분은 오랜만에 누나를 조우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앉아라. 얼굴 좀 보자."
누이는 소파에 K를 앉힌 채 두 손으로 배구 경기에서 리시브를 하듯 얼굴을 받쳐 들었다. p.218
이 따뜻하면서도 죄스러운 누나와의 만남을 통해 결국 K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격렬한 사랑의 끝도, 진정한 자아찾기의 끝도, 결국은 한 길로 통한다. 그래서 인간은 격렬한 사랑도 어느 한 사람과 끝맺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어나가고, 자아찾기도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거나 본격적으로 착수해 어느 순간 종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조금씩 천천히 해내가는 것 같다. 이 경우 결국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결국 마주하고 싶지 않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무엇이 더 용감한 일인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무엇이 더 옳은 방식인지는 대답을 보류하고 싶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
너무 좋았던, 김연수 작가의 발문에서 일부 발췌한다.
발문.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 소설가 모두를 구원하리라 -소설가 김연수 中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별하는가? 일상적인 것들에서 멀어지면서. 연인들이라면 매주 토요일이면 서로 만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밤늦게까지 통화하던 습관을 버리면서, 헤어지고 나서 언제 눈물이 제일 많이 났는지 생각하면, 이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연인의 손을 더 이상 잡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이별이다. p.389
평론가가 무슨 말을 하든, 또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읽든, 글을 쓰는 행위는 그런 모든 일들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리라. 그건 너무나 순수한 행위여서 어쩌면 선생 자신과도 무관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 한 권의 소설을 손에 쥘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선생은 소설을 계속 쓸 수밖에 없으리라. 이 계속 쓰고자 하는 힘이 아마도 우리 소설가 모두를 구원하리라. 해서 이제는 선생의 또 다른 소설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p.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