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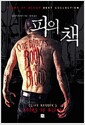
-
피의 책
클라이브 바커 지음, 정탄 옮김 / 끌림 / 2008년 7월
평점 :

품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꼭 그 이야기를 중간에 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허나 이런 행동은 상대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기야 하겠지만 정말 궁금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니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뒷 이야기를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면 최대한 무심함을 가장해야 한다.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다가 말해주기 마련이다. 이렇듯 작은 대화에서부터 작용하는 호기심은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지식을 새로 얻으려는 것도 호기심이 한 몫을 하고 있고 책을 고를 때도 그런 면이 강하다. 호기심을 끄는 제목과 소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서 책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포소설은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한다. 일반 상식으로 잴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라면 읽는 사람이 예측을 하게 되고 놀람이 없는 책은 사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소설의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했던 기발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궁금한 생각에 계속 뒷장을 넘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잔혹한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공포소설에서 가장 흥미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 역시 사람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 책 '피의 책'에서는 공포소설답게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도 피의 책이지만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의 제목도 피의 책이다. 그 단편에서 '모두가 피의 책이다. 어디를 펼치든 모두 붉다.'는 문장이 나온다. 단편 속의 피의 책을 묘사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만큼 이 책을 잘 묘사한 말도 없다. 말 그대로 어디를 펼치든 피가 철철 흘러넘칠 것 같은 내용이어서 제목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책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공포소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킹이 호러의 미래라고 극찬한 클라이브 바커의 책이니만큼 피로 물든 상상력의 최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데 흡입력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잔혹한데도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해서 이 피투성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려면 전부 읽고 기억에서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책은 9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편 소설이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단편 소설이어서 장편처럼 거추장한 장식 없이 바로 잔혹한 상상 속으로 독자를 밀어 넣는 면이 있다. 이 책을 읽는 와중에 스티븐 킹의 장편을 읽고 있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단편으로 이루어진 책을 읽으면 꽤 재밌게 읽고 난 후라도 제목만 보고서 내용의 전부가 떠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 책만은 예외였다. 어디를 펼치든 피투성이 이야기지만 끔찍한 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목차의 제목만 슬쩍 봐도 각 단편의 전체이야기가 한 번에 떠올랐다.
각 단편을 짧게 말하자면 가짜 영매사가 수많은 원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피의 책', 사람을 짐승처럼 도살하는 살인자와 한 밤의 지하철 안에서 갇혀버린 남자의 이야기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 집주인을 분노의 화신으로 바꾸려는 하급악마와 그 상황을 역이용하려는 집주인의 이야기 '야터링과 잭', 소년원에서 사라진 아이 사건의 전모와 식인 돼지에 대한 '피그 블러드 블루스', 전형적인 유령 극단 이야기지만 그 변모 과정이 묘한 느낌을 주는 '섹스, 죽음 그리고 별빛', 사람들로 구성된 거인이자 도시와 마주하게 된 두 여행자의 이야기 '언덕에, 두 도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공포의 최대한을 끌어내는 잔혹한 남자의 이야기 '드레드', 잊혀졌던 거인이 다시 지상으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살인극 '로헤드 렉스', 표류한 네 남녀와 세 마리의 양 그리고 어떤 존재들의 이야기 '스케이프 고트'가 있었다.
그나마 '야터링과 잭'은 동화 같은 느낌이 있었고 '섹스, 죽음 그리고 별빛'은 유쾌하게 웃는 유령 극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지나치게 잔혹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도 중간에 내려놓을 수 없게 사람을 사로잡아서 한 번에 읽어 내려가느라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덕분에 잠시 내려둔 스티븐 킹의 책이 지나치게 온건한 것만 같은 느낌까지 받았다. 굳이 재미있나 없나를 구분하면 재밌는 쪽에 속했지만 사람의 잔혹한 상상력의 끝을 본 기분이라 책을 읽고 난 후의 기분은 그리 깔끔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밤의 불쾌감을 단 번에 잊게 하는 잔혹한 공포 '피의 책'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 다 읽은 후에는 더위가 아니라 이 책에 담긴 내용 때문에 몸서리를 쳤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