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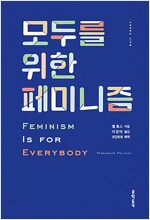

살금살금 읽었는데, 196쪽이다.
‘가부장제의 기반을 흔든 기념비적 저작’, ‘여성 해방 운동의 바이블’,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정전’이라는 문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페미니즘 책을 요만큼 읽은 사람의 한가지 생각으로는, 더 빨리 읽었더라면 페미니즘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을 정리하기에 딱 적당한 시기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페미니즘 책은 내용만큼이나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서사가 흥미롭다. 벨 훅스는 “남자들 그리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안내서가 나오기를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말했다. ‘이름 없는 문제’를 파헤친 『여성성의 신화』가 어떤 잡지에서도 지면을 얻을 수 없어 베티 프리단이 직접 책으로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역시 유명하다.
이 책도 그렇다. 1990년 터치스톤 출판사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건 내가 해고되었기 때문이었다(16쪽)”.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에도 합격하고, 논문 개요도 다 잡아놓은 상태였던 케이트 밀렛은 컬럼비아 대학의 파업에 동참했고, 그 일로 인해 다른 젊은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해고되었다.
나는 영원히 아카데미의 성벽 바깥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직업을 잃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망할 논문은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썼다. …. 나는 혼자였다. 후미오는 시간제 보수를 받고 페르시안 미니어처를 그리러 갔다. 온종일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조각하듯 이 글을 쓰기로, 재미 삼아 한번 놀아 보기로 했다. (19쪽)
그러니까 학교에서 쫓겨났고, 심사 받을 가능성도 없는 논문을, 재미 삼아 놀듯이 써 보기로 했고, 그렇게 박사 논문을 썼다. 그게 바로 이 책이다. 훗날 ‘최초의 페미니즘 문예 비평’으로 평가될 <성 정치학>은 이렇게 쓰였다. 예상치 못한 실패와 좌절에도 실망하지 않고. 재미 삼아 노는 것처럼. 너무 혁명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그리고 꼿꼿하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은, 상식의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다. 남자와 여자는 다를 뿐이고, 그 차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며,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존재한다는 신념이 상식의 범위다. 페미니즘은 남녀를 분열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상이며, 나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페미니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자랑스럽게(?) 표명하는 사람들도 그 상식의 범위 내에서 사고한다. 그런 상식들이 현재는 ‘일반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다른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남성에게도 그렇고 여성에게도 그렇다.
여성은 계급 구조에서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배자에게 생존을 기생하는 집단이 그러하듯, 여성 역시 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의존 계급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종종 여성은 주변적 삶을 살고 있으므로 보수적이 된다. 같은 상황의 모든 사람들(노예는 고전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처럼 여성도 자신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부와 자신의 생존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96쪽)
노예 해방 운동이 여성 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서술(171쪽)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참정권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설명(178쪽)이 인상적이다. 다른 사람(흑인 노예)을 돕는 가운데 자신들의 불행한 위치를 깨달은 백인 여성 선구자들. 그들의 열정적인 투쟁을 통해 여성도, 어리거나 나이 들었거나, 미혼이거나 기혼인 사실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3부 문학적 고찰>에는 『패니와 애니』의 <목사의 딸들>로 내게는 좋은 추억을 간직한 D.H. 로렌스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 『채털린 부인의 연인』에서 시작되어 『아들과 연인』, 『무지개』와 『사랑에 빠진 여인들』까지 로렌스는 한결 같다. 매우 단호하게 프로이트적이며 실제로도 그렇다.(483쪽) 그의 소설 속 남자는 모두 아름답고 완벽하며,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반한다’. 복종을 강요하는 폭압적인 남자의 요구에 여자는 스스럼없이 순종하는데, 대체로 남자의 ‘남성성’과 그 상징물, 구체적으로는 ‘그것’에 항복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은 물론 성적 흥분과 발기에 대한 로렌스식 상투어다. 대수 수업은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다. 고통이나 굴욕을 느끼는 미리엄의 모습(그녀는 나중에 이 두 감정이 솟아오른 상태에서 폴에게 처녀성을 바친다)은 폴이 느끼는 매력의 정수다. … “미리엄의 진지하고 말 없는, 말하자면 표정 없는 얼굴을 보면 폴은 다시 그 얼굴에 연필을 던지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미리엄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격렬한 감정 때문에 그는 그녀를 찾았다. 어원상 (그리고 아마 저자의 심리 속에도) ‘연필pencil’과 ‘남근penis’이 결부되어 둘은 모두 배움이자 처벌의 도구라는 사실을 독자는 불편하게 깨닫게 된다.(496쪽)
연필과 남근이라. 저번주부터 읽고 있는 이 책 『아무튼, 연필』에서도 연필과 남근이 나란했다.


남근을 떠올리니, 휴대용 남근 챙기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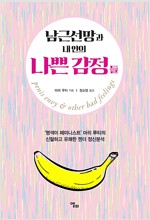
나에게 펜은 필요할 때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휴대용 남근이다.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학자들 앞에서 강의할 때에도 나는 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펜을 꼭 쥐곤 했다. 특히 경력 초기, 아무런 ‘자격’ 없던 시절에는 종종 관절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펜을 꽉 쥐었다. (『남근선망과 내 안의 나쁜 감정들』, 26쪽)
이렇게 다시 프로이트에게 간다. 어제 페이퍼도 프로이트였는데, 오늘의 마지막도 프로이트다. 가을이라 풍년인가. 프로이트 풍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