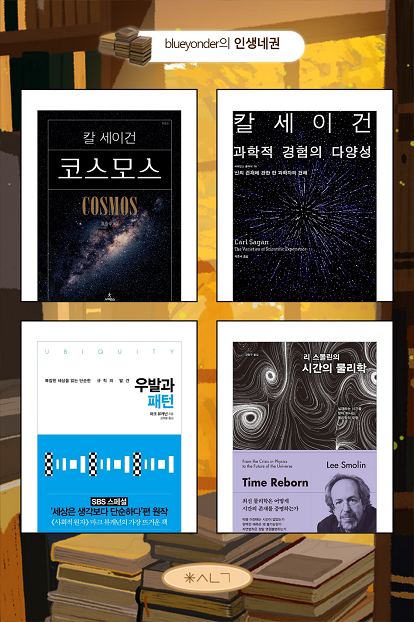나도 ‘인생 네 권’을 적어본다. 당장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중학생 때 이 책을 읽고 수학에 자신이 없음에도 이과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니 내 인생을 결정한 책이 맞다.


실제 읽은 책은 위의 책이 아니고 당시 학원사에서 나온 서광운 역의 책이었다. 광대한 우주와 그 속의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코스모스>가 사람에 따라 지루하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는 순서대로 읽지 말고 중간 아무 데나 펴서 마음 가는 대로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읽었다.
두 번째부터는 나름 고민해서 내게 깨우침을 준 책들 위주로 골랐다.
먼저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이다. 다시 칼 세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중심적 편견을 깨뜨렸다.


세 번째는 <우발과 패턴>이다. 내가 읽을 때는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로 출간됐었다. 수학을 이용해 자연을 기술하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내게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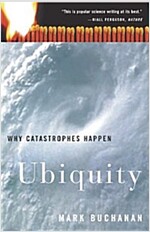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탄하며 읽은 <리 스몰린의 시간의 물리학>이다. 상자 속의 물리를 통해 얻어낸 물리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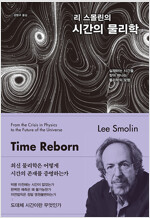

책이란 인류 정신의 보고이다. 책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주변에 내 인생의 멘토가 없더라도 책 속에서 멘토를 찾아 그의 생각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요즘에는 책 대신 짧은 영상이 정보 전달 매체로 이미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존성과 긴 호흡으로 인해 책은 영원히 살아남으리라 생각한다. 책을 읽는 당신이 바로 책의 수호자이다.
‘인생 네 권’을 고르며 다시 한 번 느낀 것. 나는 어쩔 수 없는 이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