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나는 그러니까 별로인 책을 만나도 별로라고 얘기하지를 못했다.
출판사라는 곳이 책을 향하여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책을 만드는 곳이니 사전 검증은 거쳤을테고,
알라딘 서재, 이곳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그들이 추천하는 책은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개인의 취향이라는게 존재할 수 있고,
그 취향은 개별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나 할까.
그러다보니 내 취향에 안 맞는 책을 만나도 얘기하지 못했었고,
리뷰나 페이퍼 쓰기를 건너 뛰고 넘어가서 잊혀지다 보니,
나중에 그 책을 또 구입하고,
조금 읽다가는 예전에 구입해 읽었던 별로인 책이었다는걸 깨닫고 난감해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이젠 그저그런 책을 만나면 별로라고 코멘트를 한다.
내가 내 취향을 존중하기로 한다.

문맹
아고타 크리스토프 지음, 백수린 옮김 /
한겨레출판 / 2018년 5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내게 그랬다.
그렇다고 내가 '아고타 크리스토프'를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이 분의 '존재의 세가지 거짓말'을 아주 감동적으로 잘 읽었다.
선물받아 읽었었다.
그때 친구는 연필로 밑줄의 그어가며 읽었기 때문이라며,
책을 새로 사서 보내주는 바람에,
내가 느끼는 감동은 배가되었다.
하지만, 이 책 문맹에 대해서라면 애기가 다르다.
내용은 차치해 두고,
좀 화가 난다.
책의 크기나 두께도 그렇지만, 책에 본문을 앉힌 방식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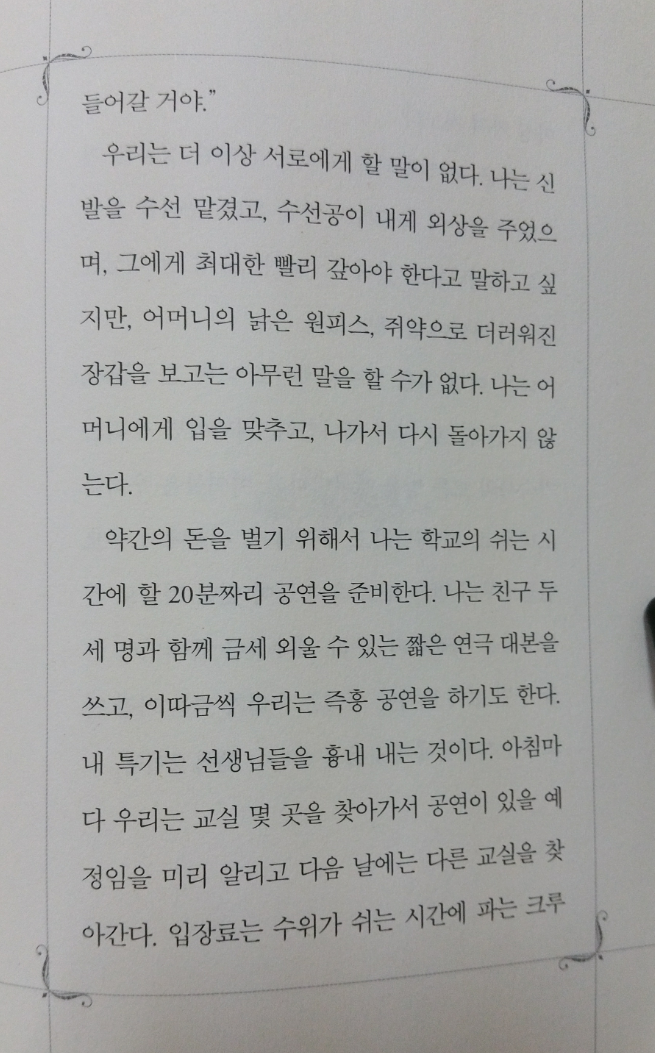
이같은 편집 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면 책은 얼마든지 더 얇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은 128쪽, 참고로 불어판은 57쪽이다.
그래서인지 내겐 책의 내용도 무미건조하고 가볍게 읽혔다.
이 사람의 출신이나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이해하려 든다면 좀 다르게 읽혔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옮긴이의 말'을 읽다보면,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고,
무미건조하다는 내 평가가 그리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만다.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여러 인터뷰를 통하여 '문맹'이 그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덜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사실에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덜 문학적일 수 있으나 그녀의 문장들, 암시와 공백으로 완성되는 그녀의 단순하고 투명한 문장들은 그 자체만으로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별과 상실, 가난과 고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시절을 그리고 있지만 크리스토프는 단 한 순간도 과도한 감상주의나 자기 연민으로 기우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일들을 담담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많은 것들을 생략한 채로 우리에게 들려준다.(125쪽)

역사의 역사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8년 6월
붙들고 있는 또 한권은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알.쓸.신.잡3'를 보면서 유시민 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리스를 방문하셔서 무모할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랄까, 역사를 대하는 겸손함과 더불어,
소크라테스에 대한 순수하고 진실한 추종 같은 것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였다.
사실 나는 '역사'를 좀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책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고 있고 가끔 한번씩 들춰보고는 있지만,
독서용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갖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아직 초반부를 읽는 중이지만,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펠로폰네소스전쟁사'의 아웃라인을 잡겠는 것이,
이젠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이 책에서 두 역사서를 비교하면서 사실을 다루는 태도와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사실과 상상력이라는 얘길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는데, 흥미로웠던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들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남자들은 집 안에서 베를 짠단다.
짐을 남자들은 머리에 이는데, 여자들은 어깨에 멘단다.
배변은 집 안에서 하고, 식사는 노상에서 한단다.(41~2쪽 갈무리)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설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