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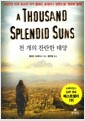
-
천 개의 찬란한 태양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왕은철 옮김 / 현대문학 / 2007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들을 셀 수도 없고
벽 뒤에 숨은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셀 수도 없으리.'
사이브에타브리지라는 시인이 17세기에 '카불'에 대해 쓴 시의 일부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를 테니까.'
이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마지막 말.
스칼렛이 그녀의 태양을 농장인 타라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라일라의 태양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에서 찾을 수 있다.
묘한 관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마리암, 사랑하는 아이들, 첫사랑인 타리크와
책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전쟁에 목숨을 바친 두 오빠, 로켓탄에 맞아 죽은 친구들,
카불의 재건을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라일라가 가진 천 개의 태양이다.
태양은 하루종일 우리를 위해 빛나지는 않는다.
지구가 열심히 움직이는 덕분이긴 해도 감성적인 묘사를 하자면
태양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는 지고 또다른 아침에 떠오른다.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새 사라지고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 있는 태양.
그러므로 태양은 희망이다.
작가의 첫 작품인 <연을 쫓는 아이>를 신선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친구를 배신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던 어느 소년이 장성한 뒤
다시 조국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낯선 아프가니스탄을 생생하게 보여준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부르카 뒤에서 눈만 내놓은 채 자신을 감춰야만 하는
여인들의 지독한 삶을 너무 가까이서 아프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다.
열넷, 열다섯 살에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학대받고 서른이 되기 전에 늙어버리는 그녀들은
조선시대 우리 여자들과 그리 다를 바 없어서 더욱 애처로운지도 모르겠다.
진리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런 지독한 삶조차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걸 다시 깨닫는다.
여전히 전쟁 중인 그곳,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봐달라고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명분 없는 싸움에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이 죽는 고통을 줄 것인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익이라는 기치 아래 다른 나라를 전쟁터로 만든
그들을 돕는 우리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또, 우리는 언제까지 단일민족이라는 웃기는 명제 아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천시하고 따돌릴 것인가.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얼굴빛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독한 고집들을 이제 그만 접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듯 그들도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은 아닐 테니.